
꿈을 만드는 공간
1. 프롤로그
상가 골목 아동복 가게 유리창에 예쁜 옷을 입은 마네킨이 섰다.
손바닥 만한 반팔 반바지였지만 알록달록 색이 선명한 군복으로 진짜 군복을 축소한 듯 그럴싸 했다. 모자까지 한 세트로 왼쪽 가슴에 무려 별이 네 개나 달려있다. 그 군복이 탐이나 몇날 며칠을 유리창에 매달려 구경을 했다.
빨간색 리본이 달린 원피스도 싫었다. 하늘하늘한 레이스가 달린 공주원피스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 마네킨이 입고 있는 군복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점심장사가 끝나 한가해진 가게로 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다. 그리고 아버지 손을 끌고 옷가게로 갔다. 가게 주인이 내준 옷을 갖춰 입고 거울에 비쳐보는데 배가 불뚝 나와 모양새가 좀 웃겼다.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어 실룩샐룩 입꼬리가 절로 움직였다.
“충성.”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군인처럼 손날을 세워 멋지게 군인처럼 아버지를 향해 경례를 했다. 그 어설픈 모양이 웃긴지 아버지 눈이 둥글게 휘었다.
“아유, 이뻐라. 댁의 아드님은 아버지를 꼭 닮았네요.”
옷가게 손님이 나를 보더니 덕담 하나를 건넸다.
아버지와 비밀스레 눈을 마주쳤다. 난데없이 옷가게로 끌려왔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름 햇살아래 과일처럼 말랑말랑했다.
“그렇지요? 똑 닮았지요?”
“어쩜 웃는 게 똑 닮았네요. 씩씩하기도 해라.”
닮았다는 그 말이 좋았다. 나만큼 아버지도 좋은지 얼굴에 웃음기가 점점 커졌다.
“자, 가자.”
입고 왔던 옷을 봉투에 담아 건넨 주인아줌마에게 값을 치르고 가게 문을 나섰다.
“으쌰.”
아버지가 나를 훌쩍 들어올려 목말을 태웠다.
하늘과 가깝게 높이 올라가자 저절로 비명이 솟았다.
“까아.”
“장군님은 용감하지.”
“네에….”
“그럼, 높은데 올라가도 안 무섭지?”
“네에에….”
가슴팍에 새겨진 별 네 개가 진짜 내 것인 냥 용기가 샘솟는 것 같았다.
“인경이 아빠 아들 맞지? ”
“네에에….”
“우리 장군님 이제 총도 사러가자.”
“네에에….”
염소같이 네에 네에만 반복해도 즐겁기만 한 하루였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서 마음 속에 뭔가가 가득 찬 것 같은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날이었다.
따뜻한 날이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뛰어놀아도 춥거나 덥지 않은 딱 좋은 그런 날이었다. 며칠 전에 동네 뒷산에서 새로 생긴 구덩이를 발견했었다. 누군가 파놓은 얕지만 제법 널다라한 구덩이는 어린 꼬마들을 상상과 모험의 세계로 이끌었다. 어떤 간첩이 숨어있었나? 혹은 어떤 산짐승이 파 헤쳐 놓은 것인가? 조무래기 아이들은 제 눈에 근사해 보였는지 반나절 내내 뛰어내렸다 기어올랐다 하며 똑같은 행동을 몇 번이나 해도 질리지 않았다. 온 몸에 찐덕한 산 진흙으로 칠갑을 하고 손톱 밑은 까만 흙으로 꼬질꼬질해졌지만 놀이는 그저 재밌기만 했다.
셋째 언니 서경이 진흙을 잔뜩 묻히고 돌아온 몰골의 나를 보며 혀를 쯧쯧 찼다. 마당 한켠 수돗가에 물을 받으며 재빨리 내 바지를 벗겨내었다. 핑크 곰돌이 모양의 하얀 속옷만 달랑 입은
내 목에 볕에 바짝 마른 수건을 두르곤 세숫대야 쪽으로 바짝 끌어 앉혔다.
“에고, 더러워라, 까마귀가 친구 하자 하겠네"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 여섯 살 많은 셋째 언니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세수를 시켜 주었다. 알뜨랑 비누였던가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던 그 비누를 들고 내 얼굴을 박박 문대어 주었다. 셋째 언니의 나를 챙겨 왔기에 손길은 익숙했고 단단했다. 눈도 맵고 코도 매워져 켁켁 거렸지만 아랑곳 않고 나를 벅벅 씻어줬다.
“흥해봐 흥.”
“흥!”
있는 힘껏 콧김을 내뿜자 다시한번 에고 더러워라 라는 추임새가 따라왔다.
비누 거품이 사라질 때까지 물 묻힌 손바닥이 몇 번이나 지난 뒤에 목에 둘렀던 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고는 이제 훤해졌네 하면서 내 뺨에 뽀뽀를 쪽 했다.
“발!”
익숙한 듯 일어서서 셋째 언니 등을 잡고 서서 한발을 세숫대야로 내밀었다. 비누거품이 잔뜩 묻은 언니의 손이 내 발을 간질러 까르륵 몸을 꼬며 웃었다.
“다른 쪽 발.”
기우뚱 하면서 발을 바꿔 내밀고 또 거품이 묻힌 손이 내 발바닥을 간질러 까르륵 또 웃었다. 겨우 다 씻긴 나를 번쩍 들어 마당 가운데 평상위로 올려주었다.
디귿자 한옥 한 가운데 평상위엔 이미 둘째 언니 주경이 대자로 누워있었다. 발치엔 마른 빨래가 한더미 였지만 둘째 언니는 그저 누운 채로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불쑥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쫙 편 채로 하늘을 향해 이리 저리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막내야! 라고 불렀다.
"마흔 이라고 해봐."
나는 아직 젖은 발을 꼼지락 거리다 둘째 언니가 쳐다보고 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하늘 서쪽엔 빨갛게 해가 저물고 있었다.
“마…흔? ”
처음 듣는 단어였던 것 같았다.
"아니, 그렇게 재미없게 말고 마아흔."
"마아흔?"
"그래, 그래 마아아흔."
"마아아아흔,."
어미 새에게서 먹이를 받아먹는 새끼 새 모양 입을 쪽쪽 벌려 나는 다시 발음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째 언니의 말 속에 들어있는 리듬은 흉내 내지가 않았다.
"정말 근사하지 않아? "
"뭐가? ”
그때 수돗가를 정리한 셋째 언니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평상으로 다가와 걸터앉으며 물었다.
“또 인경이 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치 마"
한동안 나에게 누나 라고 호칭을 부르라 시켜 엄마를 기함하게 하였던 둘째 언니이기에 셋째 언니가 매섭게 눈을 치켜 떴다.
"마흔 말이야, 마흔. "
하늘을 보고 있던 둘째 언니가 벌떡 일어나 앉아 셋째 언니를 보며 말했다.
"생각해 봤는데 마흔이 정말 근사한 것 같아. '마'하고 발음 할 때 입을 벌려야 하잖아. 그리고 흔 할 때는 콧김이 나오면서 뭔가 마무리가 된 듯한 느낌이 팍 와. “
“여태 빨래도 하나도 안 개놓고 뭔 이상한 소리야?”
셋째 언니가 탱자거리며 놀고 있는 둘째 언니에게 짜증을 냈다. 그 무렵 둘째언니는 사춘기인지 늘 큰 언니와 셋째 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태양빛이 둘째 언니의 얼굴위로 쏟아졌다. 둘째 언니의 시선은 하늘을 보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먼 곳을 서성이는 듯 해 보였다.
“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늙은 나이도 아니고. ”
익숙한 손놀림으로 낮 동안 바짝 마른 빨래를 개며 셋째 언니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자신의 세상에 빠진 둘째 언니는 다시 평상으로 훌렁 누워 두 손을 아랫배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난 마흔에 죽을 거야. 예쁠때 연애도 실컷해보고 여행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결혼도 세 번쯤 할까? 남자 따윈 그렇게 써 먹다 버려 보자고. “
나도 둘째 언니가 보고 있는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다. 특별한 것은 없는 구름이 떠다니는 평범한 하늘이었다. 그러나 언니는 뭔가에 취한 사람처럼 들떠있었다.
“마흔에 죽을 거야. 너무 멋진 것 같아. 마흔, 마아아아흔. "
"어휴, 진짜. 또 엄마한테 혼나야 정신 차리지. 일어나 일이나 좀 해."
개킨 빨래를 정리하며 셋째 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야, 조주경, 또 또 뺀질거리네. “
그때 부엌에서 반찬 담아 든 쟁반을 들고 큰 언니 효경이 나왔다.
부엌에 들어갈때부터 평상에서 노닥거리던 둘째 언니를 보자 잔소리부터 튀어나왔다.
“부엌에 가서 밥 퍼 와. 여태 상도 안 보고 뭐했어? 사춘기가 아주 벼슬이지 벼슬. "
"언니는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얼레? 저거는 맨날 서경이만 부려먹으면서 허이구. ”
“치. 나도 예전에 인경이 어릴 때 기저귀 빨래 많이 했다 뭐. ”
둘째 언니가 잔뜩 툴툴대며 일어나 평상 아래 벗어 놓은 신발을 찾아 신었다.
그 모습을 보다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큰언니가 예쁘게 웃어 주었다.
“아이구 우리 망냉이. ”
마루에 쟁반을 내려놓고 평상 위에 속옷 바람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내게 다가와 큰 언니가 다정하게 내 볼을 잡아 당겼다. 큰언니의 망냉이라는 그 특유의 리듬이 들어있는 그 단어가 좋아 해실해실 웃었다.
“으구구구, 누가 이렇게 이쁘게 씻겨줬나?”
나는 큰언니에게 답싹 안겼다.
“으이쿠.”
허리에 힘을 주며 일어나던 큰 언니가 어느새 또 자란 내 몸무게에 앓는 소리를 잠깐 내었다.
마당 안으로 산들산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아직 해는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고 집 안에는 갓지은 밥과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다. 집안엔 엄마까지 여자만 다섯. 하루를 마무리 하며 서로 분주히 움직였다.
그 날의 비누 향과 까슬 했던 수건의 감촉!
언니들이 막냉아 하고 부르던 목소리와 그 리듬 둘째 언니가 툴툴대며 끌던 신발소리까지....
참 좋은 저녁이었다.
==================================================
꼬랑쥐:
피노키오의 꿈이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오래된거짓말의 연작이기도 하여 거짓말을 어떻게 연결할까 고심했는데
물리학과 친구가 경계선이란 단어를 주었습니다.
(요즘 이 친구가 지민이(BTS) 덕질에 빠져있는지라
경계선을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경계선이란 단어는 작가 더피용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인것 같습니다.
로맨스 소설이란 장르에서 가장 경계선에 서 있었던것 같습니다.
플러스가 그랬고 오래된거짓말이 그랬고 늑대날다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뭔가 아슬아슬 경계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로맨스가 아니다, 혹자는 진짜 로맨스다 라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경계선에 서 있는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의 최은영의 지나온 시간과 오래전 묻어 둔 작가 더피용의 경계선사이에서
위태위태하게 서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지만
작가의 모습으로 경계선을 무사히 잘 넘을 수 있을지
새로운 숙제를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푱이가
dupiyongstar@naver.com
덧- 저 위에 군복은 진짜 피용이가 어린시절에 온동네 개구진 짓을 하고 돌아다니던 시절에
가장 애용하던 옷이었습니다.
저 옷을 사달라고 몇날 며칠을 울었으며 저 옷이 작아졌을때도 많이 서운해 했다는
제 어머니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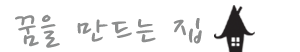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더피용
더피용 세이메이
세이메이
와!
저 에피소드가 언니 본인 얘기였다니!
왜왜 그렇게 맘에 들었던가요??ㅎ 순수한 호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