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만드는 공간
연재방. 꿈이 만들어 지는 곳
글 수 64
은 수정을 해서 e-book 으로 냈습니다.
연재 분량에서 세배 정도 늘렸는데도 아직 중편 정도네요.
홈에 있는 오래된 거짓말은 잠궈둡니다.
- 최은영-
====> 종이책에 관해서 첨언합니다.
e- book 분량에서 두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건호와 현주가 결혼하기 전의 과정이 앞부분에 들어갔어요.
집안에 의해서 현주가 끌려가듯 결혼한 과정이 새로 들어간 이야기랍니다.
뒷부분은 전자책과 같이 결혼후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호이야기가 들어갑니다.
e-book이 만추의 분위기라면
종이책은 한박눈 펑펑 내리는 날 같은 분위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을거예요.
**** 맛보기 *****
"아이구, 사장님."
강씨가 먼저 발견하고 수선스럽게 달려나갔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벌써 경비실 안으로 들어서며 만면에 사람 좋은 웃음을 지는 사장을 보며 근종 씨는 긴장하였다. 경비실에 사장이 무슨 볼일이 있는가 싶어 어쩐지 개운치 않은 기분이었다.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밖이 춥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방의 해가 나지 않은 12월의 한낮은 몹시 추웠다. 뭐라도 내릴 양인지 하늘이 시커멓고 무겁게 가라앉은 것이 아침부터 무릎이며 허리가 뭉근이 쑤셔 대고 있었다.
"많이 춥지요?"
강씨는 자신이 보던 신문을 재빨리 숨기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었다.
"불 좀 쬐러 왔습니다. 허허."
"이 누추한 곳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강씨가 손바닥만 한 경비실에서 금방 자신이 앉았던 의자 쪽으로 사장을 안내했다. 불이 발갛게 붙은 석유 난로 위에는 노란색 주전자가 펄펄 김을 뿜고 있었다. 옥수수 냄새가 나는 것이 구수했다.
공장에는 엄연한 사장실이 있었다. 최적의 난방과 질 좋은 소파까지 갖춰 두었는데 누추한 경비실에 불 쬐러 왔다는 것은 분명 진실이 아닐 것이다.
"여긴 따순 물 밖에 없는데……."
뭐라도 대접을 하긴 해야 하는데 옹색한 경비실 안에는 마땅한 것이 없었다. 근종 씨는 두 개 밖에 없는 하얀색 플라스틱 컵에 난로에서 끓고 있는 옥수수 물을 따랐다.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이 맛은 그래도 추위를 녹일 만큼은 따뜻할 것 같았다. 사장의 입맛엔 민숭하겠지만 대접할 게 이것 밖에 없으니 민망할 노릇이었다.
"눈이 오려나? 내 잠시 한 바퀴 돌아보고 올 테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강씨는 얕은꾀를 부려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은 털장갑을 찾아 손에 쥐고는 밖으로 나가 버렸다.
사장도 강씨를 따라 창문 너머로 고개를 빼고 짐짓 하늘을 올려다보는 체하며 강씨가 나가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였다.
"아주 구수하네요."
"네에, 집에서 옥수수를 볶아 왔습니다."
"어쩐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근종 씨는 난감했다.
"흠흠……. 집에 이 대리 하나만 남았지요?"
"그렇지요."
"이제 해 바뀌면 서른인데 이 대리도 어서 결혼해야지요?"
"아, 예에. 그래야지요."
아들 얘기를 하러 여기까지 왔던가? 근종 씨는 두텁게 굳은살이 박힌 손으로 괜한 주전자 뚜껑만 열었다 닫았다 했다.
"혹…… 누구 사귀는 사람이라도 있답니까?"
"글쎄, 별다른 말은 없는데…… 갸가 말을 잘 안 해 놔서……."
뒤통수를 긁적이며 근종 씨는 사장의 속내를 몰라 안절부절못했다. 그러나 신통찮은 근종 씨 대답에 이상하게도 사장은 입이 쭈욱 찢어져 실없이 웃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 대리가 입이 무겁긴 하지요. 그러면 제가 좋은 아가씨 좀 소개 해 줘도 되겠습니까?"
"아이구 별말씀을, 짝이야 저절로 생기겠지요. 감히 사장님이 소개시켜 주는 짝을 우리 형편에…… 가당치도 않습니다."
손까지 저어 가며 근종 씨는 펄쩍 뛰듯 사양했다. 근종 씨 생각에는 어지간히 비슷하게 사는 쪽에서 며느리를 얻어 와야지 괜히 사장의 눈높이에 맞는 턱없이 높은 쪽에서 얻어 오면 이래저래 골치가 아플 것 같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가 제격이다.
"저는 이 대리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남 같지 않아서 제가 참한 아가씨 하나 소개해 주고 싶네요. 저는 이 형이 부럽습니다."
"아이구, 무슨 말씀을……."
농담조의 말이지만 전혀 과장은 아닌 듯 사장의 눈빛은 진솔했다. 근종 씨는 사장이 예까지 찾아와 이런 말을 꺼내는 이상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온 것 같아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졌다.
"지가 좋다고만 하면……."
"하하, 그럼 제가 알아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집안은 안 될 텐데……, 아가 잘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 형편이 모자라서……."
근종 씨는 말끝을 흐리면서 결국 아까부터 뱅뱅 돌리던 말을 하고야 말았다. 비록 나이가 근종 씨보다 어리다 해도 이렇게 큰 공장을 운영하고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사장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큰맘을 먹고 한 시도였다.
"하이구, 걱정 마십시오. 이 대리만 한 사람이라면 싸 짊어지고서라도 데려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근종 씨는 어째 사장의 말 중에 하나가 마음에 걸렸다. 꼭 생선가시 목에 걸린 것처럼 데려간다는 말이 산뜻하지가 않았다. 잠깐 할 말이 끊어져 맨송맨송 어색하게 주전자에 뽈뽈 거리는 김만 쳐다보았다.
잔뜩 찌푸렸던 하늘에서 한 송이 두 송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허. 이런 낭패가……. 오늘은 이 대리가 운전해서 같이 내려왔는데 올라갈 생각을 하니 큰일이로세. 눈이 어두운데 길까지 이러니 어쩌나?"
사장은 근심 가득한 눈으로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한 눈송이를 쳐다보았다.
"천상 건호가 함께 가야겠네요."
아쉬웠지만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다.
"토요일인데 집에 묵었다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자주 보는 걸요."
"그럼 이 대리는 제가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한껏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근종 씨와는 반대로 뭐가 좋은지 해실해실 웃음 짓던 사장이 몸이 다 데워졌다며 일어섰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사람 좋게 인사를 건네고는 사장은 경비실을 나갔다. 사무실까지 꽤 기나 긴 길을 가로질러 가는 사장의 뒷모습을 보던 근종 씨는 착잡한 마음으로 한숨을 내리쉬었다. 막 출입문을 닫으려는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강씨가 퍼렇게 얼은 얼굴로 나타났다.
"왜서 들렸대?"
"그냥."
공장 주변을 돌아보러 간 게 아니라 어디 근처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나 보다. 사장이 손바닥만 한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니 한(寒) 대로 나가 있는 게 나을 정도로 불편했나 보다. 꽤 추웠는지 근종 씨 보다 먼저 안으로 뛰어든 강씨가 난로 옆에 바짝 다가가 얼은 몸을 녹였다. 근종 씨도 잠깐 사이 찬바람 맞은 몸을 데우기 위해 난로 근처로 갔다.
"내 보기엔 그냥이 아닌 것 같두만. 이 추운 날에 미쳤다고 정문까지 걸어왔다 가나?"
강씨의 어깨엔 벌써 눈이 묻어 있었다. 내리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래도 폭설이 내릴 듯했다.
"건호 중신 좀 선다고 하시네."
"난 또 무슨 일인가 시껍했네."
근종 씨는 마음이 복잡했다. 몸이 녹자 괜히 책상 서랍을 열어 보기도 하고 장부도 펼쳤다 닫기도 했다.
"혹시 자기 딸내미가 아닐까?"
딴에는 곰곰이 생각한 강씨가 불쑥 말을 꺼내 놓았다.
"무슨? 그런 말 마라. 어데 감히?"
"아니다. 지난번에 박 기사가 그러는데 사장이 딸만 셋이라서 건호를 그리 이뻐한다고 하드라."
"설마?"
"뭐 건호야 똑똑하니깐 부잣집 메누리 얻으면 안 좋겠나?"
강씨에겐 어림없는 소리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 근종 씨는 자꾸만 서운한 감이 들었다. 맛난 저녁을 먹이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오랜만에 집에서 끓인 청국장을 먹일까 했는데 사장이 건호를 마치 자기 식구라도 되는 것처럼 달랑 데리고 올라간다니 아들을 뺏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연재 분량에서 세배 정도 늘렸는데도 아직 중편 정도네요.
홈에 있는 오래된 거짓말은 잠궈둡니다.
- 최은영-
====> 종이책에 관해서 첨언합니다.
e- book 분량에서 두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건호와 현주가 결혼하기 전의 과정이 앞부분에 들어갔어요.
집안에 의해서 현주가 끌려가듯 결혼한 과정이 새로 들어간 이야기랍니다.
뒷부분은 전자책과 같이 결혼후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호이야기가 들어갑니다.
e-book이 만추의 분위기라면
종이책은 한박눈 펑펑 내리는 날 같은 분위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을거예요.
**** 맛보기 *****
"아이구, 사장님."
강씨가 먼저 발견하고 수선스럽게 달려나갔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벌써 경비실 안으로 들어서며 만면에 사람 좋은 웃음을 지는 사장을 보며 근종 씨는 긴장하였다. 경비실에 사장이 무슨 볼일이 있는가 싶어 어쩐지 개운치 않은 기분이었다.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밖이 춥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방의 해가 나지 않은 12월의 한낮은 몹시 추웠다. 뭐라도 내릴 양인지 하늘이 시커멓고 무겁게 가라앉은 것이 아침부터 무릎이며 허리가 뭉근이 쑤셔 대고 있었다.
"많이 춥지요?"
강씨는 자신이 보던 신문을 재빨리 숨기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었다.
"불 좀 쬐러 왔습니다. 허허."
"이 누추한 곳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강씨가 손바닥만 한 경비실에서 금방 자신이 앉았던 의자 쪽으로 사장을 안내했다. 불이 발갛게 붙은 석유 난로 위에는 노란색 주전자가 펄펄 김을 뿜고 있었다. 옥수수 냄새가 나는 것이 구수했다.
공장에는 엄연한 사장실이 있었다. 최적의 난방과 질 좋은 소파까지 갖춰 두었는데 누추한 경비실에 불 쬐러 왔다는 것은 분명 진실이 아닐 것이다.
"여긴 따순 물 밖에 없는데……."
뭐라도 대접을 하긴 해야 하는데 옹색한 경비실 안에는 마땅한 것이 없었다. 근종 씨는 두 개 밖에 없는 하얀색 플라스틱 컵에 난로에서 끓고 있는 옥수수 물을 따랐다.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이 맛은 그래도 추위를 녹일 만큼은 따뜻할 것 같았다. 사장의 입맛엔 민숭하겠지만 대접할 게 이것 밖에 없으니 민망할 노릇이었다.
"눈이 오려나? 내 잠시 한 바퀴 돌아보고 올 테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강씨는 얕은꾀를 부려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은 털장갑을 찾아 손에 쥐고는 밖으로 나가 버렸다.
사장도 강씨를 따라 창문 너머로 고개를 빼고 짐짓 하늘을 올려다보는 체하며 강씨가 나가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였다.
"아주 구수하네요."
"네에, 집에서 옥수수를 볶아 왔습니다."
"어쩐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근종 씨는 난감했다.
"흠흠……. 집에 이 대리 하나만 남았지요?"
"그렇지요."
"이제 해 바뀌면 서른인데 이 대리도 어서 결혼해야지요?"
"아, 예에. 그래야지요."
아들 얘기를 하러 여기까지 왔던가? 근종 씨는 두텁게 굳은살이 박힌 손으로 괜한 주전자 뚜껑만 열었다 닫았다 했다.
"혹…… 누구 사귀는 사람이라도 있답니까?"
"글쎄, 별다른 말은 없는데…… 갸가 말을 잘 안 해 놔서……."
뒤통수를 긁적이며 근종 씨는 사장의 속내를 몰라 안절부절못했다. 그러나 신통찮은 근종 씨 대답에 이상하게도 사장은 입이 쭈욱 찢어져 실없이 웃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 대리가 입이 무겁긴 하지요. 그러면 제가 좋은 아가씨 좀 소개 해 줘도 되겠습니까?"
"아이구 별말씀을, 짝이야 저절로 생기겠지요. 감히 사장님이 소개시켜 주는 짝을 우리 형편에…… 가당치도 않습니다."
손까지 저어 가며 근종 씨는 펄쩍 뛰듯 사양했다. 근종 씨 생각에는 어지간히 비슷하게 사는 쪽에서 며느리를 얻어 와야지 괜히 사장의 눈높이에 맞는 턱없이 높은 쪽에서 얻어 오면 이래저래 골치가 아플 것 같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가 제격이다.
"저는 이 대리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남 같지 않아서 제가 참한 아가씨 하나 소개해 주고 싶네요. 저는 이 형이 부럽습니다."
"아이구, 무슨 말씀을……."
농담조의 말이지만 전혀 과장은 아닌 듯 사장의 눈빛은 진솔했다. 근종 씨는 사장이 예까지 찾아와 이런 말을 꺼내는 이상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온 것 같아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졌다.
"지가 좋다고만 하면……."
"하하, 그럼 제가 알아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집안은 안 될 텐데……, 아가 잘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 형편이 모자라서……."
근종 씨는 말끝을 흐리면서 결국 아까부터 뱅뱅 돌리던 말을 하고야 말았다. 비록 나이가 근종 씨보다 어리다 해도 이렇게 큰 공장을 운영하고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사장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큰맘을 먹고 한 시도였다.
"하이구, 걱정 마십시오. 이 대리만 한 사람이라면 싸 짊어지고서라도 데려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근종 씨는 어째 사장의 말 중에 하나가 마음에 걸렸다. 꼭 생선가시 목에 걸린 것처럼 데려간다는 말이 산뜻하지가 않았다. 잠깐 할 말이 끊어져 맨송맨송 어색하게 주전자에 뽈뽈 거리는 김만 쳐다보았다.
잔뜩 찌푸렸던 하늘에서 한 송이 두 송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허. 이런 낭패가……. 오늘은 이 대리가 운전해서 같이 내려왔는데 올라갈 생각을 하니 큰일이로세. 눈이 어두운데 길까지 이러니 어쩌나?"
사장은 근심 가득한 눈으로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한 눈송이를 쳐다보았다.
"천상 건호가 함께 가야겠네요."
아쉬웠지만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다.
"토요일인데 집에 묵었다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자주 보는 걸요."
"그럼 이 대리는 제가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한껏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근종 씨와는 반대로 뭐가 좋은지 해실해실 웃음 짓던 사장이 몸이 다 데워졌다며 일어섰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사람 좋게 인사를 건네고는 사장은 경비실을 나갔다. 사무실까지 꽤 기나 긴 길을 가로질러 가는 사장의 뒷모습을 보던 근종 씨는 착잡한 마음으로 한숨을 내리쉬었다. 막 출입문을 닫으려는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강씨가 퍼렇게 얼은 얼굴로 나타났다.
"왜서 들렸대?"
"그냥."
공장 주변을 돌아보러 간 게 아니라 어디 근처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나 보다. 사장이 손바닥만 한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니 한(寒) 대로 나가 있는 게 나을 정도로 불편했나 보다. 꽤 추웠는지 근종 씨 보다 먼저 안으로 뛰어든 강씨가 난로 옆에 바짝 다가가 얼은 몸을 녹였다. 근종 씨도 잠깐 사이 찬바람 맞은 몸을 데우기 위해 난로 근처로 갔다.
"내 보기엔 그냥이 아닌 것 같두만. 이 추운 날에 미쳤다고 정문까지 걸어왔다 가나?"
강씨의 어깨엔 벌써 눈이 묻어 있었다. 내리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래도 폭설이 내릴 듯했다.
"건호 중신 좀 선다고 하시네."
"난 또 무슨 일인가 시껍했네."
근종 씨는 마음이 복잡했다. 몸이 녹자 괜히 책상 서랍을 열어 보기도 하고 장부도 펼쳤다 닫기도 했다.
"혹시 자기 딸내미가 아닐까?"
딴에는 곰곰이 생각한 강씨가 불쑥 말을 꺼내 놓았다.
"무슨? 그런 말 마라. 어데 감히?"
"아니다. 지난번에 박 기사가 그러는데 사장이 딸만 셋이라서 건호를 그리 이뻐한다고 하드라."
"설마?"
"뭐 건호야 똑똑하니깐 부잣집 메누리 얻으면 안 좋겠나?"
강씨에겐 어림없는 소리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 근종 씨는 자꾸만 서운한 감이 들었다. 맛난 저녁을 먹이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오랜만에 집에서 끓인 청국장을 먹일까 했는데 사장이 건호를 마치 자기 식구라도 되는 것처럼 달랑 데리고 올라간다니 아들을 뺏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2004.11.15 22:05:55 (*.124.76.235)
어디 이북에 내셨나요????
그런데 혹시 돌아온보라도리2 쓰실생각없으신지...
보라도리 보고 파요!!!!!!!!!!!!!
그런데 혹시 돌아온보라도리2 쓰실생각없으신지...
보라도리 보고 파요!!!!!!!!!!!!!
2004.11.19 10:05:58 (*.219.41.217)
축하 드립니다.
한번 쯤 더 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이북으로 나왔다니
너무 좋네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쯤 더 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이북으로 나왔다니
너무 좋네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4.11.21 00:26:59 (*.104.158.41)
이북으로 나오자마자 봤어요
숨어있는 지연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구요
하지만 너무 짧아서 또 너무 긴 여운이 남아서
아쉬웠어요
종이책으로 만날날을 기다릴께요-가능하면 장편으로...
숨어있는 지연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구요
하지만 너무 짧아서 또 너무 긴 여운이 남아서
아쉬웠어요
종이책으로 만날날을 기다릴께요-가능하면 장편으로...
2004.11.25 16:25:00 (*.221.218.10)
저도 이북으로 나와서 샀거든요.. ㅋㅋ 전에 읽었던 건 단편이였는데.. 이번거는 중편이더군요.. 좋았어요.. 내 마음속에마 갇혀 있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쯤은 제대로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였습니다. ^^
2004.12.15 00:10:50 (*.117.100.147)
저도 나오자 마자 샀어요, 아주 잘 봤답니다. 근데 넘 짧아 아쉬었는데 이게 늘린 거였어요? 더 늘려서 종이책으로 내셨음 좋겠어요^^ 예정 없으신가요?
2004.12.15 12:01:20 (*.152.174.239)
전 오래된 거짓말이 .. 동명이신 다른 분 것인줄 알고 살까말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플러스의 은영님 것이었군요..
얼렁 가서 사서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대박나세요..
얼렁 가서 사서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대박나세요..
2004.12.20 23:23:53 (*.94.170.53)
오래된 거짓말 너무 재미있게 봤답니다.
종이책으로도 나온다면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좋은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리고 수수께기 풀기도 봤답니다...
종이책으로도 나온다면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좋은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리고 수수께기 풀기도 봤답니다...
2005.01.10 21:28:45 (*.113.218.48)
강한남주,여주가 아니라 의외였던 작품이었읍니다. 가입하고 내가 안본거구나 생각해서 확인해보니 훨~~씬 전에 구매해서 이북서재에 있더군요..ㅋㅋ..
2005.01.24 11:37:01 (*.164.73.18)
I have finally read it and enjoyed a lot.
I am looking forward your next book.
can't wait.
I am looking forward your next book.
can't wait.
2005.01.28 12:35:03 (*.116.110.165)
단편에서 중편으로 다시 종이책으로.. 이북으로 보고 물흐르듯 잔잔한 건호와 현주에 사랑이 너무좋아서 종이책도 주문예약 했습니다. 중편에서 종이책으로 나온다고 내용이 많이 바뀌거나 주인공들 성격이 바뀌지는 않겠지요? 언듯 미리보는 내용중에 낯설은 대화들이 있는듯해서...
2005.03.02 14:52:10 (*.120.122.169)
어제 날짜로 정말 정말 열시미 읽었습니다
올만에 돌~까에서 지연이를 만나게 되어, 맘이 더 좋았습니다... 이준과 지연이가 만나게 되는 그날 그시간이더군여^^*
위의님 말씀처럼, 저도 보라돌이가 넘넘 보고 싶습니다
간혹 그들의 근황을 전해주실수 없을런지...
아! 글구 현주와 인경이가 상진이와 음이의 학교 선배더군여... 정말 정말 상진이와 음이가 넘넘 보고픕니다...
과연... 상진이의 노래 실력은...???
건호와 현주의 알콩달콩한 얘기가 좀더 이어졌다면 더 좋았을텐데... 읽는 독자의 마음은 한없이 아쉽다고만 느껴집니다... 님!!! 올해도 건필하시구염... ^^*
얼른 상진이 좀 불러주셈...플리지~~~~~~
올만에 돌~까에서 지연이를 만나게 되어, 맘이 더 좋았습니다... 이준과 지연이가 만나게 되는 그날 그시간이더군여^^*
위의님 말씀처럼, 저도 보라돌이가 넘넘 보고 싶습니다
간혹 그들의 근황을 전해주실수 없을런지...
아! 글구 현주와 인경이가 상진이와 음이의 학교 선배더군여... 정말 정말 상진이와 음이가 넘넘 보고픕니다...
과연... 상진이의 노래 실력은...???
건호와 현주의 알콩달콩한 얘기가 좀더 이어졌다면 더 좋았을텐데... 읽는 독자의 마음은 한없이 아쉽다고만 느껴집니다... 님!!! 올해도 건필하시구염... ^^*
얼른 상진이 좀 불러주셈...플리지~~~~~~
2005.04.11 12:30:34 (*.48.40.35)
돌까의 지연이는 아직 이준이 만나기 전이었나 봐요. 굳이 시리즈가 아니라도 아는 이름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종이책 '오래된 거짓말'... 정말 좋았습니다. 근래 읽었던 설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꽤 되다 보니 자극적인 것보단 이런 이야기들이 좋네요.^^
종이책 '오래된 거짓말'... 정말 좋았습니다. 근래 읽었던 설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꽤 되다 보니 자극적인 것보단 이런 이야기들이 좋네요.^^
2005.05.24 15:53:13 (*.231.153.115)
오늘 소장본으로 구입했습니다.
동네책방에서 봤지만 흔한 로설과는 조금 구분이 가는군요
건호의 이미지가 강하고, 너무 멋진 넘같아요..
동네책방에서 봤지만 흔한 로설과는 조금 구분이 가는군요
건호의 이미지가 강하고, 너무 멋진 넘같아요..
2005.06.07 01:12:24 (*.74.192.145)
이런 장르의 소설은 첨 읽은 거라 놀랐습니다.우리 도서실에 신간으로 소개했거든요.(미국이라 좀 늦어요) 책 안쪽에 작가소개가 생경하길래 궁금해서 들어와 봤는데 재미있는 공간이네요.소설 대단히 소박하고 재미있었습니다.어떤 과정을 거쳐 변신했는지 보고싶었는데 책이 나오면 연재분은 사라지는 거로군요.꾸준히 앞으로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2005.12.13 09:11:17 (*.178.101.18)
혹 다른책을 출간하시 않으셨나해서 들어와 봤어요.
오래된 거짓말을 너무 재미있게 읽어 벌써 새로운책이 기다려집니다. 좋은 글 많이많이 쓰세요......
오래된 거짓말을 너무 재미있게 읽어 벌써 새로운책이 기다려집니다. 좋은 글 많이많이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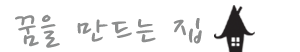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더피용
더피용 솔
솔 최아민
최아민
그래서 요새 뜸하셨군요
이젠 자주 뵐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