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만드는 공간
◆◇◆
꽃향기가 가득한 달달한 바람이 불었다.
머릿속에서 피아노 소리가 계속 울렸다. 내 시선 속에는 피터팬을 닮았던 아름다운 여성의 명랑하나 표정이 잔상처럼 떠돌았다.
‘우리애는….’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우리애는….’
피아노 원장의 밝은 웃음과 명랑함이 벚꽃처럼 나를 자꾸 들뜨게 했다.
그 사람이 키운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까?
사랑받고 살아온 사람이, 사랑을 듬뿍 주고 키우면 어떤 시선으로 세상과 만날까?
피아노 원장의 나이를 나름 가늠해 보았다. 피아노 원장의 우리 애는 몇 살일까? 질풍노도를 지나는 나이일까? 아니면 탱크 같은 김식의 나이일까?
문득 김식의 얼굴이 떠올라 말도 안돼 소리를 내며 혼잣말을 해버렸다.
그 작은 사람에게서 저렇게 큰 아이가 나올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나처럼 삐뚤어지고 고장 난 시선은 없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겠지.
문득 피아노 원장의 ‘우리애’가 부러워졌다.
내 몫의 피자와 맥주를 챙겨 통창 넘어 새롭게 생긴 일인용 침대만한 작은 평상에 앉았다. 머릿속에 울리는 햇볕 쏟아지는 아래 들었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홀짝 맥주를 마셨다.
자꾸만 생각이 피아노 원장의 얼굴과 피아노음으로 끌려갔다.
강력한 자석에 끌려들어가는 것처럼 내 시선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담지 않고 자꾸 먼 시선으로 서성거렸다.
해가 기우는 시간이지만 아직 김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김식의 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도 몰랐다. 옥탑방 입구로 들어서는 철문에 아이들이 얌전히 걸어놓은 까만 봉지를 보고 웃음이 났다. 까만 머리통이 얌전히 피아노 연주를 듣던 그 모습이 나름 진중해서 자꾸 웃음이 났다.
조그마한 밥솥에 밥을 해놓고 장 봐온 것들을 정리하며 주인도 없는 빈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는 내가 이상했다.
빈집에 객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 두었다. 불빛이 옥상 바닥에 작은 창문을 만들어 주었다. 해가 사라지는 시간의 공기를 느끼며 맥주를 마셨다. 편안한 마음으로 앉았지만 한편으로는 청각은 철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식이 언제 나타날지 예민하게 신경 쓰고 있었다.
까만 밤이 내려앉기 전에 김식이 나타났다.
서벅서벅.
발소리가 들려왔다.
등 뒤쪽의 통창이 아닌 집 옆을 돌아 김식이 바로 내가 앉아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새까만 옷에 백팩을 멘 김식의 커다란 키를 보자 잠깐이나마 피아노 원장의 ‘우리 애’랑 연결했던 내가 확연히 틀렸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 작은 분이 저렇게 큰 애를 키웠을 리가 없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김식이 기분 좋은 듯 환하게 웃었다. 학교에서 요란하게 생긴 남자의 어깨를 두르며 새초롬한 표정을 하던 김식의 얼굴은 깨끗이 지워져 있다.
“어떻게 이쪽으로 바로 와?”
“너 여기 좋아하잖아.”
성큼성큼 다가와 백팩을 벗어 내려놓고는 내가 앉은 평상 옆에 풀석 앉았다.
나는 살짝 옆으로 엉덩이를 움직여 비켜 주었다.
“오늘도 안 오면 끌고 오려고 했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다리 왼쪽 다리위로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았다.
“야아.”
김식이 지긋이 다리에 힘을 주어 내 다리를 눌렀다.
“처음 이집 왔을 때도 창밖만 보다가 사라졌잖아. 그 다음에도 튄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고.”
“뭐 주인도 없는 집안에 있기도 그렇고.”
“춘천 집에서도 평상위에서 뒹굴거리는 거 좋아하잖아. ”
“거긴…볕이 잘 드니깐.”
언제부터 평상을 좋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언니들과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서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기쁨이라며 즐거운 얼굴로 퇴근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기 때문이었을까?
김식이 손을 뻗어 내 머리통을 가볍게 잡아다 놓았다.
“웬 피자?”
내가 먹던 피자 한 조각을 덥썩 잡아 바로 입으로 가져갔다. 잠깐 먼 생각을 하다 현실로 정신이 돌아왔다.
“너꺼 따로 식탁위에 있어. 손 씻고 먹어.”
내 말에는 아랑곳 않고 내 손에서 맥주 캔까지 가져갔다. 벌컥벌컥 마시는 김식의 목울대를 보자 나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문득 저 목울대를 만지고 싶었다. 이건 정말 봄날의 장난이다.
“아, 니꺼 따로 있다고. 니꺼 마셔.”
벌컥 화를 냈지만 김식은 기분이 좋아보였다. 일어나 대신 가져오려했지만 김식이 누르고 있는 다리 때문에 일어나기 힘들었다.
“왜 나한테 다리를 올리는 거야? 다리 좀 치워봐. 무거워.”
“싫은데.”
김식이 이죽이죽 웃었다.
“내 취향을 잘 안다는 조인경씨?”
장난기 가득한 시선으로 내 눈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자 나는 슬그머니 눈을 피해버렸다.
또다시 김식이 내가 남겨놓은 피자 상자로 손을 뻗어왔다.
김식의 손등을 찰싹하고 쳐버렸다.
“야, 꼬맹이들도 피자 먹기 전에 손 씻고 먹더라. 냉장고에 맥주 있고 식탁에 피자도 있다고.”
“너 엄마처럼 잔소리 한다.”
“뭐래?”
“밥 해준다고 큰 소리 쳤던 거 같은데?”
김식이 얄밉게 빙글빙글 거리며 다시 내 다리를 지긋이 내리 눌렀다.
“낮에 피아노 원장님이 피자 두 박스 주셨어.”
“피아노 원장님? 만났어?”
나른하게 몸에 힘을 빼고 이죽거리던 김식이 갑자기 몸을 경직했다. 내 다리를 누르던 김식의 장난스러운 다리가 조금 달라진 느낌으로 전해졌다.
“왜? ”
“어쩌다 만났는데?”
“그냥…. 장보고 오는 길에 주차장에 꼬맹이들이랑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 봤어.”
“씨…. 그래서?”
나는 김식의 작은 당황함을 눈치 챈 것 같다.
“너 쫌 이상하다. 나 취조 받는 느낌인데…”
뭔가 이상한 느낌에 이번엔 내가 김식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니… 원래 아래 건물사람들 잘 만날 일이 없어서.”
“뭐 내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다. 나는 김식의 표정에서 이상함을 집어내기 위해 꼼꼼히 살폈다.
“그런 분 처음 봤어.”
“어떤?”
“이쁘고 우아하고 사랑스럽고.”
“또?”
“피자를 두 판이나 주셨어. 나 많이 먹게 생겼나?”
김식이 쿡쿡 웃었다. 그리곤 잠깐 몸에 긴장으로 들어갔던 힘을 빼고 다시 내 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리에 힘을 주어 내 다리를 지긋이 눌렀다.
“그게 다야?”
“피아노 연주를 해주셨어. 아주 예뻤어. 낮에 학교에서 본 야하게 생긴 그 놈하고는 정말 달랐지. 너 일부러 내 앞에 그 놈 데려 온 거지?”
갑자기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다.
무례하게 이지수 앞으로 다가왔던 야하게 진하게 생겼던 나와는 정반대의 시소 끝에 앉은 남자.
“내가 왜?”
슬쩍 내 시선을 피하는 김식의 눈꼬리를 보니 내 생각이 맞았나보다.
“그 놈도 정말 이쁘게 생겼더라. 맘에 들던데 확 넘어뜨릴까?”
일부러 샐쭉거리며 말했다.
“뭐?”
미간을 세우고 삐뚜름해진 김식의 표정 때문에 이번엔 내가 웃었다.
“너… 진짜. ”
벌컥 화를 내는 김식의 다리를 드디어 쳐 냈다.
툭하고 내 다리 위에 올려 진 김식의 다리가 떨어졌다.
“이 동네 시장 재밌더라. 별게 별게 다 있어. 원래는 엄마 김치 가져와 밥해주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먹을 만 한 거 많길 래 그거로 사왔어. ”
“어쩐 일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대? 며칠 더 버틸 것 같더니.”
“그냥…오늘 벚꽃이 너무 예뻐서.”
나는 눈을 접으며 예쁘게 웃어 줬다. 이 정도 쯤이야.
“너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비어버린 맥주캔을 우그러뜨리던 김식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뭐 갖다 줘? 아니면 식탁에서 제대로 먹던지. 나 밥 해놨다고. ”
내가 일어서자 김식도 같이 일어섰다.
“손도 씻어야 하고, 내가 볼게.”
서 있는 나를 툭하고 건드렸다. 방심하고 있던 나는 잠깐 휘청거렸다.
“야!”
“뭐? 왜? 늦게 온 벌이다.“
김식이 정말 기분 좋게 웃었다. 아주 별거 아닌 대화를 하는데도 아주 사소한 장난을 주고 받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평상에 식어버린 튀김과 피자와 맥주가 다시 나왔다. 그새 말끔하게 세수까지 하고 온 김식이 내 머리 위로 점버를 툭 떨어뜨렸다.
“감기 걸리지 말고.”
김식이 떨어뜨린 점버를 팔에 끼웠다. 소매가 많이 길어 내 팔이 다 나오지 못하고 덜렁거리는 소매끝을 내려다보았다.
까강.
맥주 캔 풀탭을 뜯어냈다.
내 몫의 맥주도 풀탭을 뜯어내고 나에게 내밀었다.
“팔도 짧은 게.”
김식이 다시 내 다리 위에 자기 다리를 척 걸쳤다.
바지와 바지 사이로 어쩐지 온기가 건너오는 것 같았다.
“너 알바 안가도 돼?”
“들렀다 왔어.”
멀리서 보이는 병원 간판 불빛이 예쁘게 보였다.
“너 여기서 세종 병원 잘 보이는 거 알았어? 시장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아래층에 빵집도 있고 아주 예쁜 원장님도 있고.”
하늘에 쪽달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뒷엣 말을 붙였다. 꽃향기가 잔득 묻은 밤공기에 바람이 불어왔다.
“이 집 줄까? ”
김식이 문득 내게 그렇게 물었다.
내 혼잣말에 가까운 말 속에 내가 숨겨둔 욕심이 들켰나?
“니가 이 집을 어떻게 줘? 맨날 알바나 하면서 겨우 살면서. 그리고…”
내가 속에 숨겨놓은 욕심 때문인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았다.
김식은 노란 불빛 아래 내 얼굴을, 내가 숨겨둔 거짓말을 찾으려 내 표정을 구석구석 살폈다.
“니가 이 집을 줄수 있다고 쳐. 지금은 날뛰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거겠지. ”
“호르몬?”
“그래서 아까부터 나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잖아. 호르몬 때문인 거 같은데. 그거 말고 뭐가 또 있어?”
김식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도 김식을 지지 않고 빤히 쳐다보았다.
스무살 남자의 첫 경험에 미친 호르몬. 딱 그거.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가슴 일렁거리며 나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 딱 그거.
호르몬.
“그 쪼끄만 머리로 겨우 그 생각 한 거야?”
“너의 호르몬의 유효기간에 대해 자신만만하지 말지? 한때는 나도 누군가의 기쁨이었어. 그런데도 얼마 못가 버려졌는데…”
김식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저녁 시간 내내 유쾌하게 느슨했던 입매가 딱딱하게 굳었다.
눈매가 무섭게 변했다.
“고작 쾌락 따위야. ”
픽 하고 나는 비웃었다.
내 몸에서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호르몬에 대해, 김식의 호르몬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끝날걸.”
나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김식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다. 맞다고 말해. 그래야 나중에 내가 좀 더 뻔뻔해 질수 있게.
둘의 시선이 엉켰다.
단단히 화가 난 김식의 날카로운 시선과, 나의 시선이 한 치의 틈도 없이 엉켰다.
“쾌에락? 쾌락이라 할 정도로 뭐 대단한 걸 가진 줄 아나봐? ”
이번엔 김식이 피식 웃으며 나를 비웃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정말 김식은 파랗게 화가 나 있다.
“뭐? 뭘 더해야 해? 옷도 벗어주고 다리도 벌렸는데 ”
"바보 같은 게… 그럼 제대로 해 보던가.“
“그러던지.”
나는 자신만만했다.
이건 내가 정답이었다. 호르몬이 가져온 쾌락.
김식의 차갑게 식은 눈빛이 나의 몸을 발가벗기듯 훑어 내렸다. 저 시선은 노골적인 욕망의 시선이었다.
===================
꼬랑쥐-
대략 2권 분량입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어느새 이만큼 또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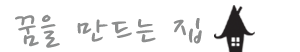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더피용
더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