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상한컷
연재작 및 출간작 그리고 등등, 감상한줄
글 수 730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리뷰는 호평을 위주로 한 것임을 미리 알립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글을 대상으로 리뷰는 쓰질 않습니다;)
김성연님의 ‘가족이 되어줘’를 다 읽고 난 독자라면, 이 글이 작가의 첫 인터넷 연재 작품(혹은 첫 글)이라는 것을 믿기가 힘들 것이다. 인연이 있어 인터넷 연재를 보아온 독자라면 글에서 연재 당시를 떠올렸을 것이나, 그 경우가 아니라면 한두 권쯤 출간을 해보았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이 책은 상당히 난숙한 솜씨를 보여준, 성취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분명한 칭찬이다. 다만 모든 말들이 그렇듯이, 그 속에 약간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그 위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
‘가족이 되어줘’가 좋은 글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소재, 주제, 구성, 작가의 시선, 문체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다면, 그건 ‘당대의 걸작’이라고 불리워야 할 듯. ^^;) 분명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 뿐.
아시다시피, 글이란 원래 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효과를 위해 경주하는 것이다. 책을 보다보면 구성 요소들 중에 문체가 훌륭한 글, 소재가 튀는 글, 구성이 뛰어난 글, 캐릭터가 좋은 글 등등 여러 잘 씌어진 글들을 본다. 보통 좋은 평을 받는 글들은 그런 호감 요소가 다른 모자란; 요소들의 단점을 상쇄한다. 상쇄한 것을 넘어 그 단점들을 아예 무시할 정도가 되면 그 글은 매우 사랑받는 글이 된다.
그러나 ‘가족이 되어 줘’는 이런 상충의 묘미(?)를 가진 글이 아니다. ‘가족이 되어줘’는 조화로운 글이다. 그래서 편안하고, 잔잔하고, 아름답다. 이런 조화는 따로 떼어놓으면 별 것이 아닌 듯한 여러 요소들이 제대로 결합한 것에 기인한다.
그럼, ‘가족이 되어줘’의 어떤 면이 그런 조화로운 글을 만들고 있는 걸까.
첫째로, 소재를 살펴보자. ‘가족이 되어줘’의 소재는, 간단히 말해서 ‘연상연하커플의-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루어지기 힘들 듯 싶은-사랑’이다.
솔직히 연상연하 커플의 연애는 요즘의 로설 소재로는 별로 눈에 튈만한 가치가 없다. 세태가 바뀌어서 실제의 생활에서 연상연하 커플이 늘어난 탓도 있고, 무엇보다 여러 연상연하 커플이 로설계에 등장해 그들의 기구한 사연;을 이미 많이 들려준 바다. 물론 여덟 살이란 나이 차이는 좀 많았지만, 그것이 ‘가족이 되어줘’의 두 주인공을 여타의 연상연하 커플에 비해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을 갖게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족이 되어줘’의 연상연하라는 소재 설정은, 다른 소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여주인 ‘지윤’이 가지는 가족 콤플렉스(내지는 소외와 고독의 콤플렉스)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윤은 가족이 교통사고로 모두 죽은 후 혼자서 6년을 스스로만의 생활에 가둔 채 살아왔다. 그녀가 스물아홉이 된 것은, 남주 재준에 비해 그저 ‘나이가 먹은 여자’가 아니라 그만큼 혼자서 쌓아온 심리적 고통의 세월이 깊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족을 잃은 이 심리적 고통은 재준과의 사랑이 피어남에 따라 그 결합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나중에 재준의 모친에게 그와의 결혼을 허락받지 못하는 외부적 갈등과 연결된다.
두 번째 ‘가족이 되어줘’의 조화로운 미적 요소로, 작가의 문체를 들고 싶다.
김성연님의 문체는 좀 특이하다. 이 글을 읽은 독자라면 알겠지만 작가는 ‘대화는 단문, 지문의 흐름은 비교적 길게’이라는 특징을 고수한다.(인터넷으로 읽었을 때, 출간되면 지문의 길이와 반점-쉼표-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약간 걱정을 한 적이 있다. --;)
대화가 단문인 것은 글에 보다 일상적인 느낌을 부여해 독자층에게 훨씬 편안하고 가까운 느낌을 준다. 특히 재준의 경우 가볍고 톡톡 튀는 사랑스러운 남주형을 창조하는데 이바지 했으며, 스물아홉에서 서른하나로 변화하는 여주 지윤에게도 산뜻하고 조용한 성격을 만들어주었다.
반대로, 지문이 흐름이 긴 것(실제로 문장은 많이 잘랐다. 여기서 흐름이 길다고 한 것은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의 사고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중간 중간 사용된 도치문도 이런 하나의 생각 단위로서는 긴 문장을 단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 같다)은, 글 전체의 분위기를 매우 온화하며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어준다.
일반적으로 지문에서의 단문은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가족이 되어줘’는 그렇지 않다. 정서적이며 따뜻하다. 등장인물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서술하는 탓이다.
더불어, 작가는 시제에 현재형을 매우 잘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소설이 거의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가족이 되어줘’는 모든 시점이 현재형이다.(아닌 장면이 있었던가?;;) 이 역시 보다 생활에, 독자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본다.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족이 되어줘’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 글이 로맨스 소설인 만큼 ‘남녀간의 사랑의 성취’가 그 주제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작가는 또 하나의 주제를 제목에서부터 분명히 깔고 있는데, 그것은 ‘가족’으로 상징되는 ‘인간적인 애정’이다.
보통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연애라고 하면 달콤하고 격정적인 감정의 흔들림이며 온갖 상심과 쓰라림, 그리고 마침내는 결실의 환희... 등등을 연상하게 된다. 로맨스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이 되어줘’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어떤 것 하나를 더했다. 바로 가족적인 애정, 흔히 말하면 ‘정’이라고 불리는 그것이다.
이점은 글에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여주 지윤이 늘 기대하고 있던 것은 단지 남녀 간의 폭풍 같은 애정만이 아니고, 그녀에게 이미 없어진 ‘가족들의 애정’이었다. 그녀를 찾아와 아들과의 만남을 그만둬 달라고 했던 재준의 모친을 보면서도, 지윤은 당장 필요한 것이 ‘든든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던 아버지의 후광’보다, 자신을 혼내면서도 ‘재준의 어머니에게 맞서 줄...(중략) 나만을 위한 편협한 시각’(p.283)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재준 역시, '앞으로 누나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다짐을 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키는 단 한 명의 기사‘(여기서의 기사는 꼭 이성간의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홀로 있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꼭 지켜주겠다고 생각한다.(p174)
개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애정이 바탕이 되지 않는 연애는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로맨스 소설이라고 해서 오로지 상대를 연애의 대상으로만 느끼는 획일적인 감정을 노래해야 하는 건 아닐 것이다.
로맨스 소설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그 위에 인간으로서의 지윤의 고독감을 치유하는 온화한 변주가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위에서 든 세 가지 요소에게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작가의 매력적인 시각-따뜻하고, 세상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로맨스 소설은 대중문학이다. 따라서 대중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대중의 사랑을 많이 입은 글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대중 소설가는, 특히 로맨스 소설이 속해 있는 장르문학(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매니아 층이 존재하는)을 쓰는 작가들은 은연중 어느 정도 자극적인 부분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것을 위해 인물의 성격을 과도하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흔히 ‘삐리리’라고 일컬어지는 정사 장면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닌가 하고 감상이 올려진 글도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을 보면 새삼스레 세상이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즐거움과 쾌락’이 목적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슬퍼진다.;)
자극적인 요소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대중문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재미’인 바에 어떻게 자극적인 요소를 빼겠는가. (실제로 ‘가족이 되어줘’에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자극적인; 정사 장면이 나온다.) 다만, 구성에 있어 그것이 돌출되거나 글 전체를 좌우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가족이 되어줘’의 모모한 장면을 보면서, ‘책 분위기는 잔잔한데 얘들, 이 장면에서 지나치게 야하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다.
...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이 되어줘’는 내게 좋은 글이었다.
연상연하라는 진부할 수 있는 소재나, 모든 문장을 현재형으로 쓰고 인물의 심리를 주로 하는 호흡이 긴 지문, 약간은 가벼울 수도 있는 일상형의 짧은 대화문, ‘가족애’라는 흔한(굳이 로맨스 소설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다른 소설에 있어서도 많이 울궈; 먹은)제 2주제, 등등은 아주 새롭거나 완벽한 기술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조화시키고 의도대로 끌어간 작가의 솜씨는 훌륭했다.
아마 이견을 달 분들도 계실 것이다. 가장 하기 쉬운 말은, ‘그저 잔잔했다’라는 말일 듯한데, 이건 이런 글을 의도했던 작가가 짊어지고 갈 몫이라고 본다. 사랑스러우면서도 뜨겁고 강렬하고, 온화하면서도 흥분되는 글이 있을까. 모든 이의 취미에 맞는 글(특히 대중문학)은 없다.
다 읽고 난 후, 마냥 뿌듯하고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다. 주제넘은 소린지는 모르겠으나 걱정도 되었다. 이유는, 몹시도 기쁘고 아름답게 여겼던 이 작가 김성연님의 따뜻한 시각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인물들도, 다음 글에는 어떤 주인공이 나타날까 하는 기대와 걱정을 돋운다. 수없는 로맨스소설이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상태로 볼 때, 꾸준한 작품 세계를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반복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첫 작부터 상당히 조련되고 안정적인 문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한 작가 특유의 온화한 분위기도 이미 상당히 노출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다음 작에 어떻게 갚아나갈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온갖 화려한 사건과 강렬한 인물들로 춘추전국을 이루고 있는 이 로맨스 소설계에서 김성연이란 작가가 어떻게 제 목소리를 지키며 발전해나갈지, 기대하는 바이다.
***오랜만에 리뷰를 씁니다. 마지막 리뷰를 쓴지 일 년이 훨씬 넘은 거 같습니다. 원래 귀차니스트라서 리뷰를 자주 쓰질 않고, 썼던 것도 다른 닉네임으로 올렸던지라 아마 몇몇 아시는 분만 아셨을 거에요. 제 나름으로는 리뷰와 글은 구분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쩔까 망설이는 중.;;
김성연님의 ‘가족이 되어줘’를 다 읽고 난 독자라면, 이 글이 작가의 첫 인터넷 연재 작품(혹은 첫 글)이라는 것을 믿기가 힘들 것이다. 인연이 있어 인터넷 연재를 보아온 독자라면 글에서 연재 당시를 떠올렸을 것이나, 그 경우가 아니라면 한두 권쯤 출간을 해보았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이 책은 상당히 난숙한 솜씨를 보여준, 성취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분명한 칭찬이다. 다만 모든 말들이 그렇듯이, 그 속에 약간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그 위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
‘가족이 되어줘’가 좋은 글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소재, 주제, 구성, 작가의 시선, 문체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다면, 그건 ‘당대의 걸작’이라고 불리워야 할 듯. ^^;) 분명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 뿐.
아시다시피, 글이란 원래 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효과를 위해 경주하는 것이다. 책을 보다보면 구성 요소들 중에 문체가 훌륭한 글, 소재가 튀는 글, 구성이 뛰어난 글, 캐릭터가 좋은 글 등등 여러 잘 씌어진 글들을 본다. 보통 좋은 평을 받는 글들은 그런 호감 요소가 다른 모자란; 요소들의 단점을 상쇄한다. 상쇄한 것을 넘어 그 단점들을 아예 무시할 정도가 되면 그 글은 매우 사랑받는 글이 된다.
그러나 ‘가족이 되어 줘’는 이런 상충의 묘미(?)를 가진 글이 아니다. ‘가족이 되어줘’는 조화로운 글이다. 그래서 편안하고, 잔잔하고, 아름답다. 이런 조화는 따로 떼어놓으면 별 것이 아닌 듯한 여러 요소들이 제대로 결합한 것에 기인한다.
그럼, ‘가족이 되어줘’의 어떤 면이 그런 조화로운 글을 만들고 있는 걸까.
첫째로, 소재를 살펴보자. ‘가족이 되어줘’의 소재는, 간단히 말해서 ‘연상연하커플의-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루어지기 힘들 듯 싶은-사랑’이다.
솔직히 연상연하 커플의 연애는 요즘의 로설 소재로는 별로 눈에 튈만한 가치가 없다. 세태가 바뀌어서 실제의 생활에서 연상연하 커플이 늘어난 탓도 있고, 무엇보다 여러 연상연하 커플이 로설계에 등장해 그들의 기구한 사연;을 이미 많이 들려준 바다. 물론 여덟 살이란 나이 차이는 좀 많았지만, 그것이 ‘가족이 되어줘’의 두 주인공을 여타의 연상연하 커플에 비해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을 갖게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족이 되어줘’의 연상연하라는 소재 설정은, 다른 소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여주인 ‘지윤’이 가지는 가족 콤플렉스(내지는 소외와 고독의 콤플렉스)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윤은 가족이 교통사고로 모두 죽은 후 혼자서 6년을 스스로만의 생활에 가둔 채 살아왔다. 그녀가 스물아홉이 된 것은, 남주 재준에 비해 그저 ‘나이가 먹은 여자’가 아니라 그만큼 혼자서 쌓아온 심리적 고통의 세월이 깊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족을 잃은 이 심리적 고통은 재준과의 사랑이 피어남에 따라 그 결합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나중에 재준의 모친에게 그와의 결혼을 허락받지 못하는 외부적 갈등과 연결된다.
두 번째 ‘가족이 되어줘’의 조화로운 미적 요소로, 작가의 문체를 들고 싶다.
김성연님의 문체는 좀 특이하다. 이 글을 읽은 독자라면 알겠지만 작가는 ‘대화는 단문, 지문의 흐름은 비교적 길게’이라는 특징을 고수한다.(인터넷으로 읽었을 때, 출간되면 지문의 길이와 반점-쉼표-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약간 걱정을 한 적이 있다. --;)
대화가 단문인 것은 글에 보다 일상적인 느낌을 부여해 독자층에게 훨씬 편안하고 가까운 느낌을 준다. 특히 재준의 경우 가볍고 톡톡 튀는 사랑스러운 남주형을 창조하는데 이바지 했으며, 스물아홉에서 서른하나로 변화하는 여주 지윤에게도 산뜻하고 조용한 성격을 만들어주었다.
반대로, 지문이 흐름이 긴 것(실제로 문장은 많이 잘랐다. 여기서 흐름이 길다고 한 것은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의 사고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중간 중간 사용된 도치문도 이런 하나의 생각 단위로서는 긴 문장을 단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 같다)은, 글 전체의 분위기를 매우 온화하며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어준다.
일반적으로 지문에서의 단문은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가족이 되어줘’는 그렇지 않다. 정서적이며 따뜻하다. 등장인물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서술하는 탓이다.
더불어, 작가는 시제에 현재형을 매우 잘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소설이 거의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가족이 되어줘’는 모든 시점이 현재형이다.(아닌 장면이 있었던가?;;) 이 역시 보다 생활에, 독자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본다.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족이 되어줘’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 글이 로맨스 소설인 만큼 ‘남녀간의 사랑의 성취’가 그 주제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작가는 또 하나의 주제를 제목에서부터 분명히 깔고 있는데, 그것은 ‘가족’으로 상징되는 ‘인간적인 애정’이다.
보통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연애라고 하면 달콤하고 격정적인 감정의 흔들림이며 온갖 상심과 쓰라림, 그리고 마침내는 결실의 환희... 등등을 연상하게 된다. 로맨스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이 되어줘’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어떤 것 하나를 더했다. 바로 가족적인 애정, 흔히 말하면 ‘정’이라고 불리는 그것이다.
이점은 글에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여주 지윤이 늘 기대하고 있던 것은 단지 남녀 간의 폭풍 같은 애정만이 아니고, 그녀에게 이미 없어진 ‘가족들의 애정’이었다. 그녀를 찾아와 아들과의 만남을 그만둬 달라고 했던 재준의 모친을 보면서도, 지윤은 당장 필요한 것이 ‘든든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던 아버지의 후광’보다, 자신을 혼내면서도 ‘재준의 어머니에게 맞서 줄...(중략) 나만을 위한 편협한 시각’(p.283)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재준 역시, '앞으로 누나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다짐을 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키는 단 한 명의 기사‘(여기서의 기사는 꼭 이성간의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홀로 있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꼭 지켜주겠다고 생각한다.(p174)
개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애정이 바탕이 되지 않는 연애는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로맨스 소설이라고 해서 오로지 상대를 연애의 대상으로만 느끼는 획일적인 감정을 노래해야 하는 건 아닐 것이다.
로맨스 소설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그 위에 인간으로서의 지윤의 고독감을 치유하는 온화한 변주가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위에서 든 세 가지 요소에게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작가의 매력적인 시각-따뜻하고, 세상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로맨스 소설은 대중문학이다. 따라서 대중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대중의 사랑을 많이 입은 글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대중 소설가는, 특히 로맨스 소설이 속해 있는 장르문학(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매니아 층이 존재하는)을 쓰는 작가들은 은연중 어느 정도 자극적인 부분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것을 위해 인물의 성격을 과도하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흔히 ‘삐리리’라고 일컬어지는 정사 장면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닌가 하고 감상이 올려진 글도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을 보면 새삼스레 세상이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즐거움과 쾌락’이 목적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슬퍼진다.;)
자극적인 요소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대중문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재미’인 바에 어떻게 자극적인 요소를 빼겠는가. (실제로 ‘가족이 되어줘’에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자극적인; 정사 장면이 나온다.) 다만, 구성에 있어 그것이 돌출되거나 글 전체를 좌우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가족이 되어줘’의 모모한 장면을 보면서, ‘책 분위기는 잔잔한데 얘들, 이 장면에서 지나치게 야하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다.
...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이 되어줘’는 내게 좋은 글이었다.
연상연하라는 진부할 수 있는 소재나, 모든 문장을 현재형으로 쓰고 인물의 심리를 주로 하는 호흡이 긴 지문, 약간은 가벼울 수도 있는 일상형의 짧은 대화문, ‘가족애’라는 흔한(굳이 로맨스 소설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다른 소설에 있어서도 많이 울궈; 먹은)제 2주제, 등등은 아주 새롭거나 완벽한 기술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조화시키고 의도대로 끌어간 작가의 솜씨는 훌륭했다.
아마 이견을 달 분들도 계실 것이다. 가장 하기 쉬운 말은, ‘그저 잔잔했다’라는 말일 듯한데, 이건 이런 글을 의도했던 작가가 짊어지고 갈 몫이라고 본다. 사랑스러우면서도 뜨겁고 강렬하고, 온화하면서도 흥분되는 글이 있을까. 모든 이의 취미에 맞는 글(특히 대중문학)은 없다.
다 읽고 난 후, 마냥 뿌듯하고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다. 주제넘은 소린지는 모르겠으나 걱정도 되었다. 이유는, 몹시도 기쁘고 아름답게 여겼던 이 작가 김성연님의 따뜻한 시각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인물들도, 다음 글에는 어떤 주인공이 나타날까 하는 기대와 걱정을 돋운다. 수없는 로맨스소설이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상태로 볼 때, 꾸준한 작품 세계를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반복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첫 작부터 상당히 조련되고 안정적인 문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한 작가 특유의 온화한 분위기도 이미 상당히 노출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다음 작에 어떻게 갚아나갈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온갖 화려한 사건과 강렬한 인물들로 춘추전국을 이루고 있는 이 로맨스 소설계에서 김성연이란 작가가 어떻게 제 목소리를 지키며 발전해나갈지, 기대하는 바이다.
***오랜만에 리뷰를 씁니다. 마지막 리뷰를 쓴지 일 년이 훨씬 넘은 거 같습니다. 원래 귀차니스트라서 리뷰를 자주 쓰질 않고, 썼던 것도 다른 닉네임으로 올렸던지라 아마 몇몇 아시는 분만 아셨을 거에요. 제 나름으로는 리뷰와 글은 구분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쩔까 망설이는 중.;;
2004.11.03 08:56:22 (*.125.153.57)
저도 언제 이런 리뷰를 쓸 날이 올까요? ㅠ.ㅠ (리뷰=감동)
'가족이 되어줘' 잔잔하고 이쁜 소설이예요. 아~~재준이 보고파라..^^
'가족이 되어줘' 잔잔하고 이쁜 소설이예요. 아~~재준이 보고파라..^^
2004.11.03 12:26:06 (*.76.121.93)
전 오늘 첨 가입해 어리둥절한 상태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리뷰를 읽게 됐읍니다.저도 어제하루만에 읽은 책이라
아직도 그여운이 남아 애잖한데요,마이니님의 리뷰를 보니
제가 얼마나 성의없이 글을 읽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사람에 따라 글을 빛낼수도 있고 그저그런 책으로 만들수 있다는걸 마이니님의 리뷰를 읽고 느꼈어요.
저도 읽으면서 재준이의 꾸밈없는 사랑에 괜시리 가슴이 설레고 그사랑에 아파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렸거든요.
잔잔하게 와닿는 글이어서 혼자 느끼기에 아까웠는데 님들과 공유할수 있어서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아직도 그여운이 남아 애잖한데요,마이니님의 리뷰를 보니
제가 얼마나 성의없이 글을 읽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사람에 따라 글을 빛낼수도 있고 그저그런 책으로 만들수 있다는걸 마이니님의 리뷰를 읽고 느꼈어요.
저도 읽으면서 재준이의 꾸밈없는 사랑에 괜시리 가슴이 설레고 그사랑에 아파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렸거든요.
잔잔하게 와닿는 글이어서 혼자 느끼기에 아까웠는데 님들과 공유할수 있어서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2004.11.03 13:08:01 (*.85.81.12)
지금 토끼눈을 하고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음
어제 밤새도록 '가족이 되어줘'읽다가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출근함.
근래에 읽은 책중에 넘 재미있고 슬픈책이었음. 주형이 이야기와 광안리 앞 바다에서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혼자 감상에 젖어서리)
책은 보며 지윤이가 잃어버렸던 5년이란 시간이 재준이와의 사랑에 큰 힘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만약에 지윤이가 사회생활을 하며 지낸 29살의 노쳐녀였다면 과연 재준과의 순수한 사랑이 이뤄졌을까. 내 사견으론 쉽지 않았을 듯 싶은데.
세상에 물들어 남들의 시선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안에서 8년차의 극복이 쉽지도 않았을 터. 하지만 가족을 잃은 5년간의 시간을 통해 또 다른 가족을 순수한 마음으로 맞이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것은 아닐런지...
마냥 줄 수 있고 마냥 바랄 수도 있는 사랑. 왠지 지윤과 재준의 사랑이 그렇게 다가온다. 가끔은 지윤의 놀림에 아무것도 모른채 정색을 하며 이야기하는 재준을 볼 때면 내 주변에 저런 마음으로 세상을 접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나 둘러보게 된다.
둘 만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준 리앙님에게 감사를 느끼며 후기부분에 마음속의 동거인이란 표현에서 마이니님의 리뷰을 다시한 번 보게 된다
여러생각을 갖게 함과 동시에 무언가 정리할 기회를 주는 책이 된 '가족이 되어줘'를 소개시켜준 마이니님과 리앙님께 사랑을 날려드립니다
어제 밤새도록 '가족이 되어줘'읽다가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출근함.
근래에 읽은 책중에 넘 재미있고 슬픈책이었음. 주형이 이야기와 광안리 앞 바다에서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혼자 감상에 젖어서리)
책은 보며 지윤이가 잃어버렸던 5년이란 시간이 재준이와의 사랑에 큰 힘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만약에 지윤이가 사회생활을 하며 지낸 29살의 노쳐녀였다면 과연 재준과의 순수한 사랑이 이뤄졌을까. 내 사견으론 쉽지 않았을 듯 싶은데.
세상에 물들어 남들의 시선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안에서 8년차의 극복이 쉽지도 않았을 터. 하지만 가족을 잃은 5년간의 시간을 통해 또 다른 가족을 순수한 마음으로 맞이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것은 아닐런지...
마냥 줄 수 있고 마냥 바랄 수도 있는 사랑. 왠지 지윤과 재준의 사랑이 그렇게 다가온다. 가끔은 지윤의 놀림에 아무것도 모른채 정색을 하며 이야기하는 재준을 볼 때면 내 주변에 저런 마음으로 세상을 접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나 둘러보게 된다.
둘 만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준 리앙님에게 감사를 느끼며 후기부분에 마음속의 동거인이란 표현에서 마이니님의 리뷰을 다시한 번 보게 된다
여러생각을 갖게 함과 동시에 무언가 정리할 기회를 주는 책이 된 '가족이 되어줘'를 소개시켜준 마이니님과 리앙님께 사랑을 날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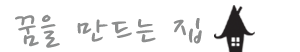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Miney
Miney 지워니베이
지워니베이 시경부인
시경부인
역시나 마이니님 대~단해요(개그 콘서트 버젼)
전 언니가 형부와 8살차이가 나는 연상연하커플이라 앞부분을 볼 땐 막연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 가을에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나 보고 싶어지네요.
'가족' 쉽게 될 수도 있고 쉽게 남남이 될 수도 있는 지금의 현실에 한 번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가 싶네요.
마이니님의 말처럼 강한 인물들의 등장으로 읽는이로 하여금 무언가 각인을 시키고자 하는 소설이 아닌 함께 동화될 수 있는 글이란 느낌이 듭니다.(읽지는 못 했지만)
겨울을 앞에 둔 이 계절에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솔직히 말하면 마이니님의 리뷰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