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상한컷
연재작 및 출간작 그리고 등등, 감상한줄
글 수 730
모든 것이 자신을 외면 했다고 느끼며 살아온, 누구에게나 아주 흔한 사랑이라는것을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비로소 알게되는 남자, 윤수.
주위 소문이 두려워 자신의 아픔을 외면해 버린 엄마에 대한 상처로 아침을 맞이하기가 두려운 여자, 유정.
아주 잠깐이지만 이 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
매주 목요일 10시에서 1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말이다.

공지영씨의 소설을 볼때면 호흡이 너무 빨라서 힘이 들곤 하는데, 영화는 반대로 지극히 잔잔함을 보여주어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책에서 보여주던 주옥같은 글들을 느낌들을 느낄 수 없어서 조금은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나쁘거나 기대 이하인건 아니다.
분명히 만족스럽고 애잔하고 재미가 있다. 하지만 주위의 통곡소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내 친구는 나처럼 까칠한 사람이랑 놀기 싫다고 하던데(이 영화를 보고 울지 않는다고), 내가 문제인게 아니라 두 배우의 2% 부족한 연기가, 영화가 내 촉수를 건드리지 못한 거겠지. 너무 드라마틱 했다고 생각해본다.

많은 장면 중에서 내 가슴속에 와 박힌 한 장면이 있다.
열다섯살에 자신의 사촌오빠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울면서 얘기하는 유정에게 자기 같은 사람때문이라며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던 윤수. 유정의 아픔 또한 자신의 잘못인 냥 용서를 비는 그의 모습에 너무나 순박하고 아픈 사람의 향기가 느껴졌다. 그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우울한 어깨를 가진 윤수의 뒷모습은 정말......
어쨌든 이 영화로 강동원은 또 한번의 도약을 한 셈이다.
이나영은 '네 멋대로 해라'나 '아일랜드'에서 보여주던 시니컬한 연기력을 다신 한번 입증한 셈이 됐다.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과연 쉽게 벗을 수 있을지 걱정이기도 하다.
쓸쓸한 이 가을 눈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픈 사람에게 추천한다. 지금 당장 휴지하나 들고 극장으로 향하시길....
주위 소문이 두려워 자신의 아픔을 외면해 버린 엄마에 대한 상처로 아침을 맞이하기가 두려운 여자, 유정.
아주 잠깐이지만 이 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
매주 목요일 10시에서 1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말이다.

공지영씨의 소설을 볼때면 호흡이 너무 빨라서 힘이 들곤 하는데, 영화는 반대로 지극히 잔잔함을 보여주어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책에서 보여주던 주옥같은 글들을 느낌들을 느낄 수 없어서 조금은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나쁘거나 기대 이하인건 아니다.
분명히 만족스럽고 애잔하고 재미가 있다. 하지만 주위의 통곡소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내 친구는 나처럼 까칠한 사람이랑 놀기 싫다고 하던데(이 영화를 보고 울지 않는다고), 내가 문제인게 아니라 두 배우의 2% 부족한 연기가, 영화가 내 촉수를 건드리지 못한 거겠지. 너무 드라마틱 했다고 생각해본다.

많은 장면 중에서 내 가슴속에 와 박힌 한 장면이 있다.
열다섯살에 자신의 사촌오빠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울면서 얘기하는 유정에게 자기 같은 사람때문이라며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던 윤수. 유정의 아픔 또한 자신의 잘못인 냥 용서를 비는 그의 모습에 너무나 순박하고 아픈 사람의 향기가 느껴졌다. 그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우울한 어깨를 가진 윤수의 뒷모습은 정말......
어쨌든 이 영화로 강동원은 또 한번의 도약을 한 셈이다.
이나영은 '네 멋대로 해라'나 '아일랜드'에서 보여주던 시니컬한 연기력을 다신 한번 입증한 셈이 됐다.
쓸쓸한 이 가을 눈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픈 사람에게 추천한다. 지금 당장 휴지하나 들고 극장으로 향하시길....
2006.09.15 15:53:48 (*.78.219.250)
영화 보고 온 친구는 원작보단 너무 멜로만 집중해서 좀 그렇다고 말하던데...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동원은 자신의 연기적 역량에 비해 영화 운이 상당히 좋은 편 같아요. 흥행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영화작업을 하는 걸 보면 말이죠....
2006.09.15 16:50:40 (*.83.191.247)
책부터 읽어야하는데!!!! 클났습니다. 제가 요즘 좀 소비를 했더니만 만만찮은 카드명세서의 금액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2006.09.15 19:44:49 (*.121.154.42)
책으로 보고 맘이 안좋아서 한동안 힘들었었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미성숙(?_한걸까요?,,,,, 현실의 까칠함을 알기에 맘 아픈것들은 좀 멀리 하고픈 성향이 있는지라,암튼 책으로 보면서 어떻하냐~`하면 맘 나름 짠했던것이 생각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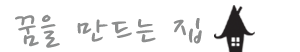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시경부인
시경부인 세이메이
세이메이 파수꾼
파수꾼 Miney
Miney
전 완전 감동받았어요! 책으로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