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상한컷
연재작 및 출간작 그리고 등등, 감상한줄
글 수 730
김성연님의 "구원"
.......................................................
우리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살자. 지금보다 더 익숙해져 서로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서로 사랑했음을,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그게 바로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일테니까...
.......................................................
열 네 살의 만남, 때론 수줍은 듯 풋풋한 첫사랑의 시작...
누구든 살다 보면, 기적을 만나는 때가 한번 정도는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기적은 치형의 고백이었다. 기왕이면 그의 기적도 나이기를 바란다.
영채의 기적은 아주 작은 우연과 마주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지못한 찰나의 아주 작은 그의 웃음에서부터...
그 순간의 모습이 기억으로 새겨져 오랜 추억으로 이어질지 짐작이나 했을까요.
영채에게 있어 치형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무채색이었던 그 때.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온전한 웃음을 웃을 수가 없었던 법.
어느날 살며시 내밀어진 1회용 밴드 위로 수줍게 볼을 붉히던 여자 아이.
그 아이에 의해서였습니다.
칙칙하기만 했던 나의 주변이 채색되기 시작했고,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낌은...
치형에게 있어 영채는... 세상과 이어주는 창이었습니다.
열 일곱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들에게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떨리면서도 기분 좋은 설레임입니다.
스물 두 살, 여전히 현재 진행형 혹은 조금은 오래된 연인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가 있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 치형
"그럼 왜 여태껏 아무 말도 안했어!" ... 치형
"네가 못들은 거야. 너무 바빠서." ... 영채
여전히 보고싶다고.. 얼마큼 이란 말에 많이 란 말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챙겨주면서도
그 애만이 전부였던 시기를 지나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많이 웃을 수 있는 효율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 는 생각도 하게 되는, 조금은 느스한 편안함. 편안함 속에 불안함. 초조.
그래서였는지도...
어느날부터인가,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바라봐주는 것 같고
내가 더 오래 기다리게 되는 것 같은 일상 속의 시간들이 점점 길어짐에 불안감이 어긋남으로 다가오는 건.
그래서... 이별을 통보합니다.
사랑이란 게 별 거냐.. 사랑은 또 올 수 있지만 지금의 이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는다며..
헤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위로하면서.....
그런데... 말이죠.....
사랑은 또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영채'나 혹은 '치형'이 아닌 건 어떻게 잊어야 할까요...
머리에 한번 담긴 추억은 잠시 잊혀질 순 있어도, 지워지는 건 아닐지도.
어느 순간 맹렬한 기세로 갑작스레 찾아와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새 차를 타고 가다 멈춘 낯익은 골목길, 다친 손에 사용하라고 스탭이 건네주는 1회용 밴드...
베인 상처가 이제와 너무나 아파오는군요. 미치도록 아파서 보고 싶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하는데,
제발 늦지 않게 내 마음이 말하는 걸 들어주기를...
나한테는 네가 있어야 하니까.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네가 없으면 안돼.
내가 행복해할 수 있었던 바로 네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마치 제가 사춘기 시절의 주인공들과 어른이 된 주인공들을 따로 따로 만나는 것처럼 두 편의 사랑 이야기를 보는 듯 풋사랑의 설레임을 맛보는 것도 좋았구..
오래된 연인들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너무 익숙해서 생겨나는 오해, 갈등, 이별의 아쉬움등이 조화를 이루며 내용이 펼쳐지는 것두 읽는 재미를 더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책가방속에서 꾸깃꾸깃해진 걸 펴보려고 깔고 앉아 있어서 뜨듯해진 대일밴드(1회용 밴드)을 망설이고 망설이다 머뭇머뭇 치형에게 건네는 영채의 모습을 보며 저도 치형이처럼 '귀여워~'를 연발했답니다.
음, 소소한 부분에서 참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만족스런 가운데 아주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책의 마무리 부분의 치형과 영채, 그들의 헤어졌다 다시 재회할 때의 순간이 조금은 밋밋하게 지나가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치형이가 영채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과 영채가 치형의 집에서 기다리다 재회하는 장면 사이에 영채가 치형을 뒤따라 나와 그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조금 더 첨부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뭐랄까... 이리저리 찾다가 딱 마주쳤을때의 반가움에 대한 극적인 효과라 할까요.
그리고 오타 부분인데요.
p.218 - 치형의 전화를 받고 다음날 오후에 미영과 치형을 (=> 지훈을 ) 베네치아로 불러냈다.
- p.38 의 '과거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에 가운데서 글씨체가 달라지는 편집 실수 이외에는 술술 잘 넘어가다가 딱 걸려버린 듯 해서 아쉬움이 들더라구요.
아, 이거만 아니면 완벽 했는데... 하면서.^^;;
그럼에도 책을 읽는 동안
작가님의 바람대로 될 거란 예감에 더욱 흐뭇한 감상이었습니다.
리앙님과 저, 그리고 독자분들이 한번으로 끝나는 인연은 결코 아닐거라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과 시선, 늘 간직하셔서 다음에 또다른 어여쁜 커플들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내 행복했습니다... ^^*
언제나처럼 건필하기를~
.......................................................
우리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살자. 지금보다 더 익숙해져 서로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서로 사랑했음을,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그게 바로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일테니까...
.......................................................
열 네 살의 만남, 때론 수줍은 듯 풋풋한 첫사랑의 시작...
누구든 살다 보면, 기적을 만나는 때가 한번 정도는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기적은 치형의 고백이었다. 기왕이면 그의 기적도 나이기를 바란다.
영채의 기적은 아주 작은 우연과 마주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지못한 찰나의 아주 작은 그의 웃음에서부터...
그 순간의 모습이 기억으로 새겨져 오랜 추억으로 이어질지 짐작이나 했을까요.
영채에게 있어 치형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무채색이었던 그 때.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온전한 웃음을 웃을 수가 없었던 법.
어느날 살며시 내밀어진 1회용 밴드 위로 수줍게 볼을 붉히던 여자 아이.
그 아이에 의해서였습니다.
칙칙하기만 했던 나의 주변이 채색되기 시작했고,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낌은...
치형에게 있어 영채는... 세상과 이어주는 창이었습니다.
열 일곱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들에게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떨리면서도 기분 좋은 설레임입니다.
스물 두 살, 여전히 현재 진행형 혹은 조금은 오래된 연인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가 있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 치형
"그럼 왜 여태껏 아무 말도 안했어!" ... 치형
"네가 못들은 거야. 너무 바빠서." ... 영채
여전히 보고싶다고.. 얼마큼 이란 말에 많이 란 말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챙겨주면서도
그 애만이 전부였던 시기를 지나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많이 웃을 수 있는 효율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 는 생각도 하게 되는, 조금은 느스한 편안함. 편안함 속에 불안함. 초조.
그래서였는지도...
어느날부터인가,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바라봐주는 것 같고
내가 더 오래 기다리게 되는 것 같은 일상 속의 시간들이 점점 길어짐에 불안감이 어긋남으로 다가오는 건.
그래서... 이별을 통보합니다.
사랑이란 게 별 거냐.. 사랑은 또 올 수 있지만 지금의 이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는다며..
헤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위로하면서.....
그런데... 말이죠.....
사랑은 또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영채'나 혹은 '치형'이 아닌 건 어떻게 잊어야 할까요...
머리에 한번 담긴 추억은 잠시 잊혀질 순 있어도, 지워지는 건 아닐지도.
어느 순간 맹렬한 기세로 갑작스레 찾아와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새 차를 타고 가다 멈춘 낯익은 골목길, 다친 손에 사용하라고 스탭이 건네주는 1회용 밴드...
베인 상처가 이제와 너무나 아파오는군요. 미치도록 아파서 보고 싶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하는데,
제발 늦지 않게 내 마음이 말하는 걸 들어주기를...
나한테는 네가 있어야 하니까.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네가 없으면 안돼.
내가 행복해할 수 있었던 바로 네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마치 제가 사춘기 시절의 주인공들과 어른이 된 주인공들을 따로 따로 만나는 것처럼 두 편의 사랑 이야기를 보는 듯 풋사랑의 설레임을 맛보는 것도 좋았구..
오래된 연인들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너무 익숙해서 생겨나는 오해, 갈등, 이별의 아쉬움등이 조화를 이루며 내용이 펼쳐지는 것두 읽는 재미를 더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책가방속에서 꾸깃꾸깃해진 걸 펴보려고 깔고 앉아 있어서 뜨듯해진 대일밴드(1회용 밴드)을 망설이고 망설이다 머뭇머뭇 치형에게 건네는 영채의 모습을 보며 저도 치형이처럼 '귀여워~'를 연발했답니다.
음, 소소한 부분에서 참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만족스런 가운데 아주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책의 마무리 부분의 치형과 영채, 그들의 헤어졌다 다시 재회할 때의 순간이 조금은 밋밋하게 지나가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치형이가 영채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과 영채가 치형의 집에서 기다리다 재회하는 장면 사이에 영채가 치형을 뒤따라 나와 그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조금 더 첨부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뭐랄까... 이리저리 찾다가 딱 마주쳤을때의 반가움에 대한 극적인 효과라 할까요.
그리고 오타 부분인데요.
p.218 - 치형의 전화를 받고 다음날 오후에 미영과 치형을 (=> 지훈을 ) 베네치아로 불러냈다.
- p.38 의 '과거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에 가운데서 글씨체가 달라지는 편집 실수 이외에는 술술 잘 넘어가다가 딱 걸려버린 듯 해서 아쉬움이 들더라구요.
아, 이거만 아니면 완벽 했는데... 하면서.^^;;
그럼에도 책을 읽는 동안
작가님의 바람대로 될 거란 예감에 더욱 흐뭇한 감상이었습니다.
리앙님과 저, 그리고 독자분들이 한번으로 끝나는 인연은 결코 아닐거라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과 시선, 늘 간직하셔서 다음에 또다른 어여쁜 커플들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내 행복했습니다... ^^*
언제나처럼 건필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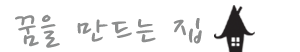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스타티스
스타티스 자몽
자몽 Miney
Mi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