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만드는 공간
◆◇◆
춘천을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해가 이미 졌다. 어둠이 살금살금 빈 논과 먼 산에 내려 앉았다.
마지막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터미널로 향했다. 짐이라고도 별거 없었다. 춘천 집에 내가 머물 동안 필요한 짐은 얼마든지 있었다.
시험 보러 나오기 직전 햇볕이 들지 않는 방도 정리를 끝냈다. 대략 몇 달 동안 비어있을 것을 대비해 대충 정리해 두었다.
다만,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뚝배기와 플라스틱 통이 걸렸다. 그 날 이후 김식을 보지 못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학생식당에 가지 않았다.
학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점심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과방에서 빈 강의실에서 나는 섬처럼 굴었다.
화는 내가 났는데,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가버린 김식이 오래도록 머리에 남았다.
지가 뭔데?
학교에서 오갈 때 가끔 오토바이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거 먹을래?”
이지수가 왔다.
과방에서 벽을 보고 앉아 책만 보고 있는데 다가왔다. 까만 비닐봉지를 달랑거리며 내게 내미는데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니.”
나는 높은 벽을 둘렀다.
“그래 그럼. ”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내 뒤쪽에 앉았다. 이지수와 나는 등을 돌린 채 앉았다. 나는 완고했고 이지수는 조심스러웠다.
“이것만 말할게. 그… 김식이가 학교 자퇴했대. 너 알고 있었어? ”
“아니.”
언젠가 김식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서 의대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났다.
잘됐네. 이제 안 봐도 되겠네. 주고받은 것도 대충 계산이 났다. 이쯤이 깔끔한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족보랑 예상문제 찍어 놓은 거.”
내 가방에 이지수가 슬쩍 파일 하나를 밀어 넣었다.
난 내가 시시하게 굴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럼에도 이지수 쪽으로 등을 돌리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밀고 들어왔다. 옷깃을 바짝 여기고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다. 벌써 하얀 입김이 쏟아지는 밤거리를 걸었다. 버스를 타기엔 가깝고 걸어가기엔 조금 먼 집으로 부지런히 걸었다.
환한 불빛이 가득 찬 집을 바라보자 기분이 좋아졌다. 삐걱 소리를 내는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겨울을 맞이한 집은 마루를 둘러싼 유리문이 꽁꽁 닫혀 있었다. 그중 한 문이 덜컹 열리며 엄마 얼굴이 보였다.
“누가 왔나?”
마당에 주볏거리며 서서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야, 막냉이 왔네.”
엄마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마루 아래로 달려 내려왔다.
“전화를 미리 좀 해주지.”
뽀글거리는 머리에 음식냄새가 잔뜩 나는 옷을 입은 엄마가 사뿐사뿐 달려와서 나를 안았다. 열린 문 뒤로 하나, 둘, 셋, 넷. 문 사이로 까만 머리가 바쁘게 나타났다.
“와, 막내다.”
“나도, 보자.”
“나도.”
엄마를 따라 도청 언니들이 하나 둘 신발을 급하게 찾아 신고 우르르 마루를 내려왔다. 엄마 뒤로 차례차례 한줄을 섰다.
엄마의 주름진 손이 내 등을 토다토닥 두드려 주었다.
전화기 속의 음성처럼 괜찮다, 다 괜찮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엄마의 따뜻한 심장이 내 심장과 닿은 것 같았다.
“어머니, 우리도요. ”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한 줄로 나란히 선 도청 언니들이 야단법석 굴었다.
엄마가 나를 안은 손을 느리게 풀자 한 줄로 선 언니들이 두 발을 종종 거리며 재촉했다.
“우리도 안아도 되요?”
“저두요.”
“나두요.”
오른손을 번쩍 들고 저요, 저요 하는 언니들을 보고 엄마가 어처구니가 없는 듯 푸스스 웃었다. 나도 멋쩍게 웃었다.
“그래. 닳는 것도 아닌데 …. 대신 살살해.”
둘째 언니를 닮은 명랑한 언니가 다가와 나를 답싹 안았다. 나보다 한참 키가 작은데 발 뒷굼치를 들고 나를 안아 주었다.
“보고 싶었다. 막내야. “
내 등을 엄마가 했던 것처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오구오구, 이쁜 것.”
명랑한 둘째 언니를 닮은 언니가 팔을 풀고 비켜서자 큰언니를 닮은 도청 언니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는 나에게 답싹 안겼다. 나는 어정쩡히 서서 두 팔로 언니를 감싸 안아주었다.
“우와, 이런 기분이구나. 나도 보고 싶었다. 막내야.”
풍성한 머리카락이 코끝을 간질거렸다.
큰언니를 닮은 언니가 지나가자 이번엔 서경언니를 닮은 언니가 나를 안았다. 가만히 심장소리가 들릴 것처럼 조용히 그냥 안아주었다.
“나도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낯선이가 다가와 나를 안았다.
“반가워요. 막내씨.”
“지난달부터 우리 식구다.”
낯선 사람에 대한 설명을 엄마가 뒤에서 해줬다. 그세 한 사람이 더 늘었다. 처음 보는 그 사람도 도청 언니들 뒤에 줄을 섰다가 내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기분이 이상하고 낯설었다.
“춥다. 들어가자. 막내 밥 아직 안 먹었지?”
“알타리가 아주 맛있게 됐어. 밥 먹자.”
“으으, 춥다. 막냉이 왔으니깐 더 맛있는 거 해주실거죠? ”
둘째 언니를 닮은 도청언니의 말에 마당에 와르르 웃음이 터졌다.
“이번엔 닭 말고요. 다른 거.”
“소도 좋아요. 소.”
시끌벅적한 환대에 나도 가만히 웃었다.
코끝이 빨갛게 얼었는데도 기분이 좋았다.
요란하고 복닥거리는 집에 드디어 도착했다.
저녁 밥상을 치우고 엄마의 방에 나란히 누웠다.
방은 따끈따끈했고 이불을 보송보송했다. 머리맡에 엄마가 또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의 노래를 나직하게 틀었다.
엄마의 이상한 노래가 바뀌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음음음 어 허허 ]
“노래가 이상해.”
여름의 그 밤 처럼 나는 말했다.
“생긴 것도 쫌 이상해.”
엄마가 웃으며 여름의 그 밤처럼 대답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엄마가 나를 보고 모로 누웠다.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다 손을 뻗어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뒤에 가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라고 해. 그거면 되는 거지 뭐.”
아기를 재우듯 느리게 토닥토닥 리듬을 주어 두드렸다.
“우리 막내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엄마가 미안해. ”
엄마의 리듬에 맞춰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래도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말어. 때론 시간이 약이다. ”
따뜻한 바닥, 온기가 전해오는 푹신한 이불 그리고 엄마의 손길에 스르륵 잠이 쏟아졌다. 이제야 조금 위로를 받았다.
*노래- 김국환 타타타
========================
꼬랑쥐-
엄마의 플레이리스트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친정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를
되새겨보고는 있는데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지 10년쯤 지나니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푱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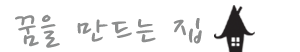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더피용
더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