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잠자는 집
수다 수다 그리고 이야기
글 수 397
날짜:2003/12/05 14:37
어제 낮에 구민이를 재우다 [천국의 계단] 재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뻔한 콩쥐팥쥐형 구조엔 뭐 이래? 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 뻔한 설정에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아, 만고의 진리다. 콩쥐팥쥐를 보면 흥분하면서도 몰입한다는 것은.;;
마지막 장면에
추운 바닷가에 하얀 그랜드 피아노를 치는 권상우가 나왔다.
-아, 이 배우는 처음 짜장면 배달통을 들고 나타났을때부터
(이병헌도 한때 짜장면 배달통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이후 뜬 배우가 되었지만) 눈여겨 보았었는데
어느새 눈부신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후까시 잡으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장면을 소설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까?
잠시 머리속에 말도 안되는 상상이 펼쳐지면서
원래 후까시 많은 이준이지만, 저 장면을 패러디한 후까시 장면을
문득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 무언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 정말 구리구리합니다.
말하고 싶은것은 우아한 백조가 물밑아래서 수없이 버둥거리는 움직임처럼
남주가 후까시 잡기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피아노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거지요.
그냥 웃자고 조금 바꿨습니다.
깜깜한 밤이었다.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칠흑처럼 어두운 밤. 하늘에 걸린 한 조각 달만이 밤을 함께해 주고 있었다.
끼이이익!
대관령 고개를 지날 때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자동차 타이어와 노면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밤중에 서울에서부터 단숨에 달려오는 검은 승용차는 커브 길도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광포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위험한 곡예를 하듯이 그렇게 승용차는 자신을 망치려는 것처럼 어둠이 잔뜩 내려앉은 어두운 대관령을 넘고 있었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안고 이준은 거칠게 운전을 하며,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조금만 더 가면, 탁 트인 바다가 나올 것이다. 지연과 함께 시간을 공유했던 그 바다가…….
미칠것같은 광포함이 넘실넘실 춤을 춘다.
"나야. 해줄 일이 있어."
이준은 거칠게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잠을 자다 깬 형철이 낮게 불만을 터뜨리는 소리가 수화기 건너서 들려왔다.
"지금 바다로 간다.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해."
"드디어 미쳤군요. 이시간에 어디서 피아노를 구한단 말입니까?"
형철의 항의는 어이가 없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많이 컸다."
이준의 한마디에 기세등등했던 형철이 포르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패했다. 잠시후면 이준이 원하는 대로 바다가에 피아노가 마련될 것이다.
끼익. 급한 소리와 함께 거칠게 차가 멈췄다.
그러나 지금껏 거친 속도로 달려온 것과 다르게 주차한 차 안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소금기가 배인 바람이 불어오자 이준은 지금껏 미칠 것 같은 광포함이 수그러졌다. 숨을 쉬지 못할 것처럼 옥죄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자 이준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갖고 싶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다. 그래서 욕심을 냈고, 겨우 손에 쥐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미안해, 지연아.'
다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차문을 열고 천천히 바닷가로 걸어갔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지나 거친 파도로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바다를 쳐다보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물을 받아보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 함께했던 여행지였다.
밤하늘 별빛을 받은 그랜드 피아노가 황량한 바닷가에 놓여 있었다.
어지러운 사람들의 발자국과 트럭이 지나간 바퀴자욱이 바닷물에 그 흔적을 도난당하고 있었다.
"으아."
밤하늘을 가르고, 몸 안 깊숙한 곳에서 밀고 올라오는 비명이 사방을 울렸다. 바람에 부대끼는 셔츠가 제멋대로 펄럭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이준은 마음 깊은 곳에서의 울화를 터뜨려 버렸다.
거칠게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차갑게 얼은 손으로 이준은 피아노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헨델의 사라방드의 음이 거친 기세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눈물 한방울이 또르르 뺨위로 흘러 내렸다.
차가운 만추의 달이 지고 있었다.
조금씩 소리도 없이 겨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쩝.
어제 낮에 구민이를 재우다 [천국의 계단] 재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뻔한 콩쥐팥쥐형 구조엔 뭐 이래? 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 뻔한 설정에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아, 만고의 진리다. 콩쥐팥쥐를 보면 흥분하면서도 몰입한다는 것은.;;
마지막 장면에
추운 바닷가에 하얀 그랜드 피아노를 치는 권상우가 나왔다.
-아, 이 배우는 처음 짜장면 배달통을 들고 나타났을때부터
(이병헌도 한때 짜장면 배달통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이후 뜬 배우가 되었지만) 눈여겨 보았었는데
어느새 눈부신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후까시 잡으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장면을 소설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까?
잠시 머리속에 말도 안되는 상상이 펼쳐지면서
원래 후까시 많은 이준이지만, 저 장면을 패러디한 후까시 장면을
문득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 무언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 정말 구리구리합니다.
말하고 싶은것은 우아한 백조가 물밑아래서 수없이 버둥거리는 움직임처럼
남주가 후까시 잡기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피아노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거지요.
그냥 웃자고 조금 바꿨습니다.
깜깜한 밤이었다.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칠흑처럼 어두운 밤. 하늘에 걸린 한 조각 달만이 밤을 함께해 주고 있었다.
끼이이익!
대관령 고개를 지날 때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자동차 타이어와 노면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밤중에 서울에서부터 단숨에 달려오는 검은 승용차는 커브 길도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광포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위험한 곡예를 하듯이 그렇게 승용차는 자신을 망치려는 것처럼 어둠이 잔뜩 내려앉은 어두운 대관령을 넘고 있었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안고 이준은 거칠게 운전을 하며,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조금만 더 가면, 탁 트인 바다가 나올 것이다. 지연과 함께 시간을 공유했던 그 바다가…….
미칠것같은 광포함이 넘실넘실 춤을 춘다.
"나야. 해줄 일이 있어."
이준은 거칠게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잠을 자다 깬 형철이 낮게 불만을 터뜨리는 소리가 수화기 건너서 들려왔다.
"지금 바다로 간다.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해."
"드디어 미쳤군요. 이시간에 어디서 피아노를 구한단 말입니까?"
형철의 항의는 어이가 없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많이 컸다."
이준의 한마디에 기세등등했던 형철이 포르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패했다. 잠시후면 이준이 원하는 대로 바다가에 피아노가 마련될 것이다.
끼익. 급한 소리와 함께 거칠게 차가 멈췄다.
그러나 지금껏 거친 속도로 달려온 것과 다르게 주차한 차 안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소금기가 배인 바람이 불어오자 이준은 지금껏 미칠 것 같은 광포함이 수그러졌다. 숨을 쉬지 못할 것처럼 옥죄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자 이준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갖고 싶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다. 그래서 욕심을 냈고, 겨우 손에 쥐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미안해, 지연아.'
다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차문을 열고 천천히 바닷가로 걸어갔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지나 거친 파도로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바다를 쳐다보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물을 받아보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 함께했던 여행지였다.
밤하늘 별빛을 받은 그랜드 피아노가 황량한 바닷가에 놓여 있었다.
어지러운 사람들의 발자국과 트럭이 지나간 바퀴자욱이 바닷물에 그 흔적을 도난당하고 있었다.
"으아."
밤하늘을 가르고, 몸 안 깊숙한 곳에서 밀고 올라오는 비명이 사방을 울렸다. 바람에 부대끼는 셔츠가 제멋대로 펄럭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이준은 마음 깊은 곳에서의 울화를 터뜨려 버렸다.
거칠게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차갑게 얼은 손으로 이준은 피아노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헨델의 사라방드의 음이 거친 기세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눈물 한방울이 또르르 뺨위로 흘러 내렸다.
차가운 만추의 달이 지고 있었다.
조금씩 소리도 없이 겨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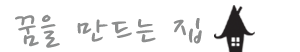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더피용
더피용
스타티스 지겹다고 하면서도 뚜렷한 선악구조와 콩쥐팥쥐형 드라마가 여전히 인기는 좋으니 작가분들에겐 필요악마냥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소재일려나요.그나저나 새엄마가 아이들에게 보이는 가학적인 행동은 솔직히 적응이 안되네요.으~;;악인이라해도 그 행동이 이해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싸이코와는 분명 차이가 있을듯한데.. [2003/12/05]
석류 하하하..넘 웃겨요~~~~~~~~ 천국의 계단 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이준의 얼굴이... 불상한 형철...^^;;;; [2003/12/06]
뽀송맘 이준, 피아노까지 칠 줄 압니까? 커억... 못하는 것도 없구만;;; 것도 헨델...;;; 그나저나 대문이 또 다시 변신했군요. 멋집니다. 카페도 이렇게 예쁠 수 있다니... [2003/12/06]
더피용
헉;; 피아노를 그렇게 멋지게 칠줄 모르지요.당근 그냥 패러디였습니다. 사람들이 열라 준비한 피아노에앉는 장면을..;;; 후까시 잡는....;;;;
헉;; 피아노를 그렇게 멋지게 칠줄 모르지요.당근 그냥 패러디였습니다. 사람들이 열라 준비한 피아노에앉는 장면을..;;; 후까시 잡는....;;;; [2003/12/06]
뽀송맘 석류님 멘트 보고 생각났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필 받는 일 있으면 우리 형철이랑 현우 얘기도 좀 써 주세요. 형철씨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할 거 같은데... 그 쪽은 왠지 적당한 부부싸움도 해가면서 살 것 같거든요. 우리 현우한테는 언제 꽃이 피려나......-_- [2003/12/07]
마이니 설마 현우에게도 꽃이 필 날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