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잠자는 집
요 근래 아버지에 관한 도서를 두권을 읽었습니다.
신경숙의 [아버지에게 갔었어]
정지아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왜 이분에게만 님을 붙이냐면 무려 65년생이었습니다.
두 책을 섞어 읽어서 중간에 스토리가 좀 혼동되기도 했지만
두 작품의 아버지의 성격은 너무 다릅니다.
아버지에게 갔었어의 유약하지만 삶을 살아낸 다정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한때 빨갱이여서 온 몸을 살라 세상과 맞선 아버지
를 보면서 어느 대목에선 찔끔찔끔 눈물을 짜기도 하고
아련해지도 하더군요.
특히 아버지에게 갔었어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유언과도 같은 그 부분은
벚꽃이 마구 떨어지는 어느 흐린 봄날에
공원에 앉아 읽었더랬죠. (뒷부분을 먼저 읽었죠)
아, 우리 근종씨의 일기장 글보다 아니 글만큼
다정하고 또 다정해서 (여섯 아이들을 향한 하나하나 다정한 문구)
아이를 여섯을 낳을 것을 그랬나? 하는 후회도 잠깐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구찌보다는 구씨가 (작년 최대의 히트상품은 손석구라 할 정도라)
떠오르는 제목(나의 해방일지)이어서
조금 망설이다 읽기 시작했는데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제 취향이라 잠깐 서서 삼분의 일 정도를 수식간에
읽어버렸죠.
이쯤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을 잡으실 듯....
근 십년만에 [오래된 거짓말]책을 열었습니다.
책꽃이에 꽂혀 먼지를 뒤집어 쓴 책을 열어
파트 3 부터 찾아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쓴 글이라는 것도 잠시 잊고
앉은 자리에서 파트3을 다 읽어버렸습니다.(뭐 그리 긴 페이지도 아님서;;;)
건호의 일기장 부분에서는
어느 문장은 이건 뺄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지만
어느 한순간 막히지 않고 한번에 읽으면서
피식거리도 하고, 조금 찔끔거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것을 썼나?
혹시 빙의해서 쓴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뿌듯함과 부끄러움이 같이 밀려왔습니다.
근종씨의 이름은 시아버님 성함과
외삼촌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 예전 어느 날 해발 700미터 근처에 살고 계시던
엄마에게 갔을 때
늦은 저녁 마당에 불을 피워 놓고 고기와 술을 잔뜩 차려 놓고 먹던 어느 여름날
외삼촌(엄마의 남동생, )께서
제가 그 책을 써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책꽂이에 저 책을 꽂아놓고
지나실때마다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서 웃었다고
그 말을 전하시더군요.
-저 어렸을 때 젓가락질 못한다고 무섭게 혼내던 외삼촌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나오는 아버지 성함이 외삼촌 이름에서 따왔다고 했더니
정말 정말 더 좋아하시더군요.
책을 낸 제가 그저 기특하고 기특하다고 하셔서
사실 그렇게 대단한 책은 아니예요. 라고 답했더니
일 때문에 원주에 이틀에 한번 꼴로 다니시는 외삼촌께서
본인에게는 제일 좋은 책이라고 토지보다 더 좋다고
술기운을 빌어 말씀해주셨어요.
(토지라니? 아마 외삼촌이 알고 계신 가장 대단한 책이라서 일지도 )
-외삼촌에게 엄마는 누나이지만 일찍 돌아가신 외할머니 대신 엄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냈다니 대견하셨는지도요.
이 외삼촌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도 못 뵈었습니다.
10년이 넘었네요. -
아주 오랫동안 그 날을 잊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그날의 그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모분께서 오래된 거짓말의 근종씨는 정말 좋은 어른이었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오래된 거짓말에서 좋은 어른은 근종씨 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피용이가 만약에 만약에
다시 글을 쓰게 된다면
좋은 어른이 잔뜩 나오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고
아주 수줍게 모분께 고.백.을 했습니다.
-시어른들과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밖에 남지 않은
푱이가
dupiyongstar@naver.com
2023년 5월 11일 오늘도 다녀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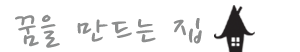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더피용
더피용 세이메이
세이메이
이 아침에....눈물바람하게 하시네요ㅠㅠ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좋은 일들보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는 나이라...마음이 무거워요......
저두 아주 수줍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써 주기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