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만드는 공간
◆◇◆
겨울 하늘이 파랗게 시린 날이었다.
바람은 사납게 불었지만 햇볕은 다정한 그런 날이었다.
옥탑 건물 일층에 위치한 베이커리 가게 넓은 창가에 커피 한잔에 커피 번 하나를 시켜놓고 나른히 앉아있었다. 전철역에서 이쪽 방향으로 오는 사람들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사람 역시도 한눈에 들어오는, 이쪽 길 방향을 향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식이 말년휴가를 나오는 날이었다.
옥탑 방 청소도 깨끗이 했고, 한쪽에 급하지 않은 짐부터 정리해 놓았다. 김식이 내게 맡기고 간 숙제를 말끔히 해 낸 것 같은 개운함과 약간의 설레임도 있었다.
대략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 질 즈음 나름 마중을 나와 이곳에 앉아있었다.
투명한 창 안으로 흐르는 햇볕아래 제목을 모르는 귀에 익은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고 빵 냄새와 커피 냄새가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조용한 거리에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늘씬한 다리였다.
허벅지를 반쯤 드러낸 짧은 치마 아래로 굽 높은 부츠가 종아리를 감싸고 있는 근사하게 긴 다리였다. 훌쩍 큰 키에 이 동네에선 생경한 화려한 옷차림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와 전체적으로 얇은 몸매의 선을 가진 미인이었다. 뒷모습만으로도 시선을 끄는데 앞모습은 과연 어떨지….
길 건너 방향에서 오는 것을 못 봤으니 택시나 자동차에서 내린 모양이었다. 허리부분까지 오는 짧은 무스탕 코트를 여미고 선 여자가 겨울 찬바람에 한껏 어개를 움츠렸다.
무엇을 찾는 것인지 도로와 길가를 두리번거리는 여자의 옆 모습이 언뜻 언뜻 보였다.
“예쁘네.”
긴 머리카락 사이로 뽀얗고 높은 콧날에 무심코 혼잣말을 했다.
아니… 춥겠다.
몰래 여자를 훔쳐보는 것 같아 시선을 돌리려 했다.
시계를 흘끗 내려다보고 다시 전철역에서 넘어오는 횡단보도를 살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도 시선을 천천히 돌리려 했다. 길가에 뼈만 남은 가로수 사이로 시선을 옮기는 찰라 언뜻 군복이 스쳐갔다.
빠르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긴 머리를 출렁이는 여자가 군복 입은 남자를 잡았다. 깡총거리며 군복 입은 남자의 팔을 잡아챘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있던 큰길 가 쪽에선 누구도 온 이가 없었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택시나 자동차로 이동한 듯 내 시선 밖에서 느닷없이 나타났다.
칼 각으로 갖춰 입은 군복에 막 외출을 나온 듯 등 뒤에 가방을 멘 군복 입은 남자가 자신의 팔을 잡은 여자의 팔을 잡았다. 실갱이인지 다정함인지 알 수는 없으나 두 사람은 지나치게 가깝고 노골적으로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다.
키가 큰 여자가 군복 남자의 품 안쪽으로 쏙 들어갈 정도로 가깝다 생각한 순간 나는 벌떡 일어섰다.
나는 저 군인을 알고 있다.
똑같은 옷을 입은 군인 백 명 사이에서도 골라낼 수 있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순간 알 수 없는 열기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투명한 창 밖에서 서로 서로의 팔을 잡고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과 군인을 보는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뾰족한 통증이 심장 근처를 내리쳤다.
머리가 차게 식었다.
천천히 출입문을 향해 걸었다.
나는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았다.
가게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만 뻐끔거리는 물고기처럼 나는 잠깐 허우적거리며 걸었다.
공기 중을 걷는데도 걸음이 부유하듯 느렸다.
가게 문을 열자 영하의 차가운 겨울 바람에 내 뺨을 후려쳤다.
산소가 모자란 듯 뻐끔뻐끔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향해 걸었다.
“…뭐하냐?”
꼭 쥔 주먹 안에 날카로운 손톱이 손바닥을 찔러왔지만 난 느끼지 못했다.
두 다리를 겨우 지탱하고 서서 두 사람을 향해 그렇게 물었다.
바짝 붙어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내 시선 안에 들어왔다.
나는 군인을 노려보았다.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볼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기억해놔야지.
시간이 흐른 후 미래의 어느 날 내가 다시 몰랑몰랑해 지고 싶은 어떤 날에 그 표정을 다시 떠올려야하니까.
“너 뭐. 하. 냐. 고?”
“ㅊ ㅇ …어?”
뭐라 하는지 뭉개진 웅웅 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잠깐 스쳐왔다.
이따위로 뒤통수를 칠거면서 나한테 달달하게 굴었나?
언제는 내꺼라고 하더니.
나에게 속해 있다고 달콤하게 말하더니.
그동안 달달함에 취해 바보가 되었나보다. 이미 한번 버려졌었는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군인이 팔을 잡고 선 여자를 거칠게 밀어냈다.
그리고 내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또박또박 내 앞으로 걸어왔다.
나도 그 시선을 또렷하게 쳐다보았다. 물속에 있는 냥 소리도 웅웅거리고, 찬 바람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냉정한 시선으로 그 눈을 쳐다보았다.
워커 신은 발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한발, 한발, 또 한발. 다급하게.
그리고 나를… 내 표정을 내려다보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나를 내려다보았다.
두 주먹을 억세게 쥐고 뻣뻣하게 서 있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를 끌어안았다.
겨우 숨만 몰아쉬는 나를 세게 껴안았다.
죽여 버릴거야.
죽여 버릴거야.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말을 되뇌이며 나는 얼음기둥처럼 서 있었다.
김식에게 밀려 진 여자가 휘청이다 몸을 일으켰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미친년 산발머리 같이 검은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여자가 주섬 주섬 귀신같은 머리칼을 두 손으로 걷어내고는 얼굴을 드러냈다.
자그맣고 하얀 얼굴이 머리카락 사이에서 드러났다.
오똑하게 선 콧날과 천사 같은 커다란 눈동자 보송보송한 붉은 입술이 커튼처럼 드리워진 머리카락 사이에서 존재를 드러냈다.
“아…씨발. 밀고 지랄이야. 넘어질 뻔 했잖아.”
쭉 뻗은 다리를 가진 여자가 나를 향해 반갑게 웃었다.
“근데 니네 길바닥에 뭐하냐? ”
------------------------------------------
꼬랑쥐-
원래 가려던 길에서 약간의 방향 수정이 필요한것 같아
저도 허우적거렸습니다.
푱이가
dupiyongstar@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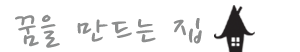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더피용
더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