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만드는 공간
“응”
통창을 보고 있는 소파 옆에 작은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있었다.
이사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한 짐을 정리하고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소파 옆에 나란히 앉은 김식이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또다시 내 다리 위에 본인의 다리 한 짝을 걸쳐 올려놓았다.
“응.”
엄마의 잔소리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고개를 돌려 김식을 향해 뭐? 하며 입모양으로 물었다. 수화기 넘어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김식과 시선을 맞췄다.
“김식이가.”
고분고분한 내 대답에 김식이 피식피식 웃음을 흘렸다.
“응.”
소파 등받이에 팔을 걸치고 내 목덜미를 손을 뻗어 지분거리자 목을 움츠리며 김식을 쏘아 보았다.
“응…알았어.”
옆에 앉은 김식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거렸다.
“열흘쯤 있다가…… 알았어.”
무사히 이사를 마쳤고, 엄마도 내가 보낸 짐과 김식이 보낸 선물을 잘 받았다는 말 이외에 잘 먹어라 따뜻하게 지내라 하는 평범한 잔소리를 내내 듣고 전화를 끊었다.
“왜 자꾸 웃는데?”
“어머니한테만 제대로 말랑거리네. ”
춘천에 도착한 빈곤한 내 짐을 본 엄마가 속이 상해하는 말임을 잘 알고 있다. 그 빈약한 짐마저 내려 보내면 나는 무엇으로 살 거냐며 또 근심걱정을 쏟아내었다.
대신 엄마는 내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생긴 것이 좋은 것 같았다.
“가끔씩 나한테도 말랑거려줘도 될 거 같은데.”
김식이 허벅지 위에 올린 다리에 힘을 주어 꾸욱 내 다리를 눌렀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사도 했잖아.”
“열흘쯤 있을거면 나 입대하고 춘천으로 간다는 거지?”
김식이 아주 흡족하게 웃으며 물었다.
“남의 전화나 엿듣고.”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옥탑방에 새롭게 들어온 이불 한 채와 현주의 그림을 3인용 소파 주변에 이쁘게 장식했다. 마치 요 공간이 내 공간 이다 하고 선을 그은 것처럼 유치한 표시를 해두었다.
통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김식도 내가 보는 곳으로 눈을 돌렸다.
11월의 귀한 햇살이 옥상 아래로 내리고 있었다.
이 집은 김식과 닮아 있었다. 다정하고 따뜻했다.
“ 이 집 지은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곳에 앉아 비가 오는 것을 보는 게 좋았다.
이곳에 앉아 통창 전체로 눈 내리는 모습도 좋을 것 같았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잘한 것인지에 대해 수 백 번 생각했다. 내 안의 작은 욕심이 더 커질까봐 결정을 계속 미뤘는지도 몰랐다.
“난 집 같은 건 잘 모르지만 가끔씩 통창 아래에 누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내 목덜미에 닿은 김식의 손가락이 작게 리듬을 치듯 움직였다.
“계산은 정확히 하자. 방세랑 건물 청소하는 거 알려줘.”
목뒤의 손가락이 움직임을 딱 멈췄다.
“청소를 너가 왜 해?”
“가끔씩 김치도 주시고 먹거리도 갖다 주신다며?”
“그건 그냥 그 집 아들 때문에 음식을 많이 해서 그래.”
“그래서 너도 청소해준다며?”
“넌 신경 안 써도 돼. 얘기 다 끝났어.”
콩하고 김식이 내 이마를 살짝 쥐어 박았다.
욱하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김식이 다시 내 다리를 힘주어 눌렀다.
“너는 왜 맨날 알바 해? 궁해서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냥…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많아서?”
“가끔씩 돈도 헤프게 쓰고. 소꼬리라며? 할머니가 좋은 거 먹이겠다고 입이 찢어졌대.”
이번에도 김식이 건네준 황금보자기 안에는 거창한 음식이 들어있었다. 엄마는 어쩔 줄 모르고 할머니는 기운이 펄펄 났다고 한다.
“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보내지 마.”
“날 걱정 하는 거야? 할머니가 좋은 게 싫은 거야?”
“빚지는 거 싫어.”
김식이 빤히 내 눈과 시선을 맞춰왔다.
“갚는 거 골치 아파.”
슬쩍 시선을 피했다.
시끄러운 눈빛으로 담배연기를 날리던 나를 보던 김식의 눈빛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넌 왜 사람이 좋아?”
김식의 눈을 보고 딱 잘라 물었다.
그래서…말이 많아졌다.
“딱히 좋아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니…넌 좋아해. 축제 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 보니 알겠더라. ”
“그랬나?…걔들은 그냥 짐이야. ”
슬쩍 내 시선을 피하고는 김식이 성의 없이 대답했다.
“나도 짐인가?”
“엄청 큰 짐이지. 너가 제일 클걸? 손 많이 가고. ”
팔꿈치로 김식의 가슴을 쿡하고 쳤다.
“같이 데리고 입대 할 수도 없으니 제일 큰 짐이지.”
김식이 입대하기까지 열흘 남았다.
“아무나 붙잡고 나랑 잘래 하지 말고.”
“…내가 바본가?”
“성질난다고 병들고 설치지도 말고.”
내짧은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김식의 손가락이 신경 쓰였다. 목 뒤가 간질간질한 것 같았다. 내색않고 가만히 김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피식피식 웃는 입가와는 달리 눈빛은 진지했다.
“아프면 저기 세종 병원으로 재깍재깍 가고.”
“그렇게 말하니 짐 맞네. 나 걔들 만나도 돼?”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다.
“누구?”
“건축과 한장우, 이쁜 애가 서경후, 그리고 주기도.”
한 번도 내게 소개시켜주지 않은 사람들 이름을 말했다.
조금 곤란한 표정이었다.
“쫌 싫은데….”
확실히 곤란한 표정이었다.
학교에서 눈인사 정도는 하는 한 장우도 축제날 내게 지갑을 채가던 서경후도 김식 옆에 있는 나를 여자라고 단정해주던 빨간 입술의 주기도도 궁금해졌다.
“왜?… 거기서 내가 제일 예뻤다면서?”
왈칵 치밀어 물었다.
“그게… 나 어릴 때 집에 사람들이 좀 많았어. 니꺼 내꺼 구분 없이 섞이는 게 싫더라고.”
갑작스런 김식의 말에 다음 말을 가만히 기다렸다.
꼬맹이 김식은 어쩐 모습이었을지 잠깐 머릿속에서 스쳐갔다.
“ 그냥 내꺼는 손 타는 거 싫거든. ”
가만히 김식이 나의 눈과 시선을 맞췄다.
내 이마에 입술을 꾸욱 하나 눌렀다. 마치 내꺼 라고 도장을 찍는 거 같았다.
오토바이 뒤에 아무도 안태운다고 했다. 그런데 김식은 춘천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토바이 뒤를 내주었다. 이 집도 나만 온다고 했다.
어쩐지 진한 고백 같았다.
쿵쿵 심장이 울렸다.
다시 손바닥에서 부터 저릿한 통증이 울렸다.
“니가 젤 좋아하는 게 걔들 아냐? 둘은 같이 데리고 입대도 한다며.”
“밥 먹자. 고기 먹자며? ”
김식이 내 허벅지 위에 올렸던 다리를 내렸다.
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내꺼 라는 단어만 남아 윙윙 거렸다.
입 꼬리가 저절로 실룩거리며 풀어지려 했다.
“그냥 너도 나중에 이런 집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
주방 쪽으로 가는 김식의 등을 향해 살짝 말했다.
“지금도 좋은 사람이지만… 나중에도 좋은 어른이었으면 좋겠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식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진심이었다.
푱이가
dupiyongstar@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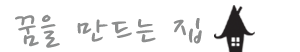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더피용
더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