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모저모
꿈집에서 일어난 일. 이런저런 소식들.
글 수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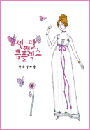
한수영님의 "셋째딸 콤플렉스"
책제목 : 셋째딸 콤플렉스
지은이 : 한수영
출판사 : 러비더비
발행일 : 2004년8월2일
정 가 : 2,500 원
<줄거리>
누가 그랬던가. 최진사댁 셋째따님의 미모는 온 동네방네를 떠들썩하게 해 뭇 남정네들의 밤을 지새우게 했다고.
우리의 최가현.
최씨에 셋째딸로 그 명성과 함께 한때 꽃미모로 날렸던 과거를 갖고 있지만 그녀가 한때 잘 못 들어선 길로 인하여 그녀는 살을 사랑하는 좋은 이름으로 곰인형. 나쁜 이름은 푸대자루 뚱순이가 되었는데...
살을 사랑하는 가현이 그녀의 살 이상으로 사랑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맛보기>
하나님, 부처님!
노랗게 탈색된 머리를 보니 분명 얌전한 총각은 아니었다. 이렇게 외진 골목에서 어둠 속에 단둘이 서있자니 예술적인 흥분으로 팽창되었던 신경이 급속도로 졸아들었다. 지금이야 염색한 머리가 흔하지만 내가 고3일 때만 해도 그런 머리 한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좋았다. 노란 머리는 개성이라기보다 불량의 상징이었다. 두려움이 슬금슬금, 야금야금 내 심장을 좀먹어 들어왔다.
돈이라도 뺏으려고 그러나? 안 다치려면 다 줘야겠지? 그런데 얼마나 있더라?
내가 예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심이 동해서 쫓아오는 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하며 비틀었던 고개를 원위치 시켰다.
침착하게 천천히 걸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오히려 허둥대면 저 사람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천천히 걸으려니 다리가 꼬이려고 했다. 허둥대는 내 모습, 하나도 우습지 않았다. 그냥 무서웠다.
숨 쉬어, 최가현. 숨….
다시 한 걸음 내딛는데 적당한 높이로 발을 들지 못해서인지, 땅바닥에 닿자마자 발목이 휘청하더니 발등이 뒤집어졌다. 발등과 땅바닥의 접촉, 발목에서 불이 일었다.
“아얏!”
굉장히 아팠다. 눈물이 고일 정도로 아팠다. 빌어먹을! 투덜거리는데 귓가에 낮게 울려 퍼지는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쿡.”
내 발이 뒤집힌 순간에 그도 걸음을 멈췄다.
웃어? 왜 웃는 거야? 정말 이 자식 날 쫓아오는 거 맞잖아.
안되겠다 싶어서 나는 아픈 발을 억지로 질질 끌었다. 이를 악물고 골목길을 지났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눈에 익은 파란 대문이 보였다. 나는 이제는 숫제 달렸다. 이런 발로 달릴 수 있다는 건 니체가 죽었다던 초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난 달렸다. 어떻게 달릴 수 있었는지 묻지 말라. 맞기 싫어서 달렸을 뿐이다.
이 놈의 가방은 또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야한 잡지가 잔뜩 든 가방이 날 허우적거리게 했다. 게다가 뛸 때마다 같이 출렁이는 내 뱃살들.
살아, 살아 내 살들아!
어떤 개그맨이 떠들어대던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이 놈의 살들. 도망갈 때 엄청 거추장스러웠다.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터라 달리기도 질색이었다. 숨이 턱에 찼다. 호흡이 가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점점 대문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었다.
됐다!
대문에 도착한 내가 벨을 누르려고 손을 내미는데 기다란 손이 뒤에서 쑥 나왔다. 허무했다. 내 눈동자가 밑으로 뚝 떨어졌다. 얄미운 손이 차임벨을 눌렀다.
이게 뭐다냐?
“누구세요?”
엄마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러나 난 아무 말도 못했다. 황당무계, 뒤쫓던 깡패가 벨을 누르다니! 우리 집을 털러 왔나? 뇌란 놈이 잠시 얼었다.
“어머니, 접니다. 유하.”
유하? 유하가 누구지? 어떤 놈인데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가? 언니 애인이라도 온 건가? 그럼 날 따라온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가는 길이었단 말이야? 내가 오버액션을 했군. 근데 둘 중에 누가 이런 불량스런 청년을 사귀는 거지?
가만, 유하? 유하라고!
지이 캉!
대문이 열렸다. 재빨리 발을 들여놓으려는데 내 팔목을 낯선 남자, 아니 유하라고 하는 남자가 잡았다. 포동포동 살 오른 팔뚝에 비해 가는 내 팔목이 남자의 한 손에 쏙 들어갔다.
“불협화음이네. 이거 안 끊어지냐? 훗.”
녀석은 낮고 허스키한 음성으로 웃었다. 우리 인체의 신비, 젤리질의 안구는 절대 얼 수 없다는데 내 건 이미 얼어버렸다.
“이봐, 최가현 낭자! 벌써 서방님 목소리도 잊어버린 거야?”
- 본문 내용 중에서 -
2004.08.05 16:04:59
유하...난 저런 저돌적인 남자가 좋다...가현이를 세상 누구보다 예뻐하는 남자...웃으면서 재밌게 봤어요^^ 작가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기분이라 무척 좋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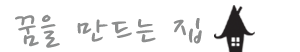


 시경부인
시경부인 쟈넷
쟈넷